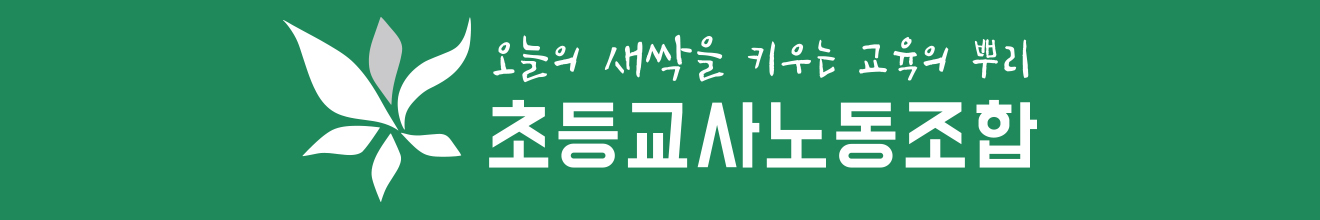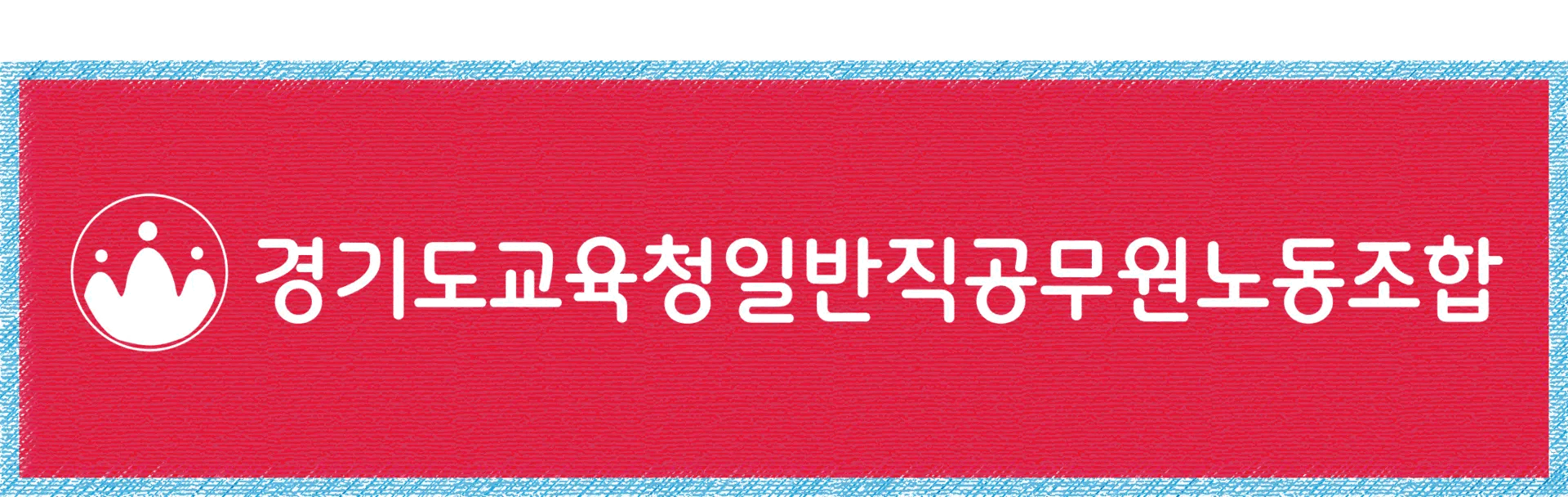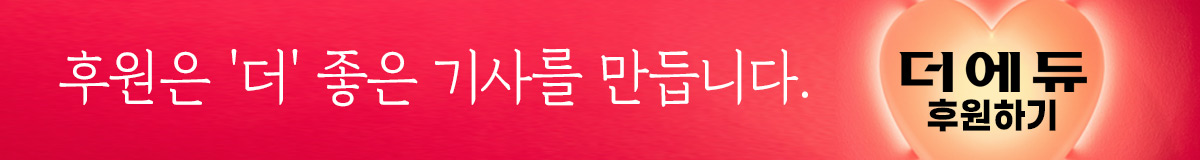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매체에 따라 달라질까? 노르웨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종이로 읽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이러한 차이를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The smell of paper or the shine of a screen? Students’ reading comprehension, text processing, and attitudes when reading on paper and screen>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와 화면을 통한 읽기에 대한 태도와 실제 독해력을 조사했다.
오슬로 대학에서 교사 교육을 연구하는 라그힐드 엥달 옌센, 아스트리드 할, 마르테 블릭스타드-발라스 3명의 연구자는 다양한 읽기 수준을 가진 10명의 8학년 학생들을,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해 실제 학생들의 읽기를 분석했다. 학생들은 시선추적 안경을 쓴 채 노르웨이 국가 읽기 평가를 종이와 화면으로 각각 진행했고 연구진은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먼저 학생들이 종이와 화면에서 글을 읽고 처리하는 이해 성능을 체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70개의 독해능력 테스트 중 종이로는 55개, 화면으로는 44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읽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시선추적을 한 결과, 모든 학생은 문항을 읽기 전에 지문을 읽는데, 종이로 읽게 되면 문항과 종이 사이를 38번 왔다갔다 했지만 화면에서는 112번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전환이 읽기 능력 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봤으며, 학생들은 화면으로 읽을 때 지문을 더 자주 다시 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에게 종이로 읽는 것과 화면으로 읽는 것의 차이에 대한 경험을 요약하도록 요청했을 때,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읽으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의 차이가 그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믿지 않았다.
즉, 학생들은 정보를 찾거나 종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별 차이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종이에 비해 화면에서 읽을 때 훨씬 더 피상적이며 ‘뒤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고 결론을 냈지만, 학생들 스스로는 매체 간 차이가 별로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는 화면에서 읽는 것을 더 선호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두 매체를 통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읽기 전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0명이라는 학생 표본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향을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