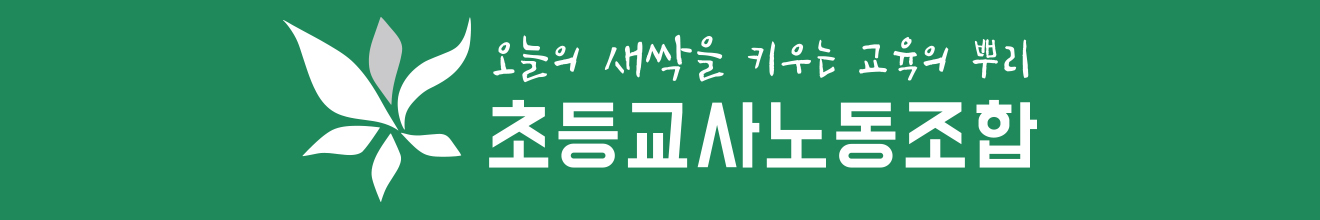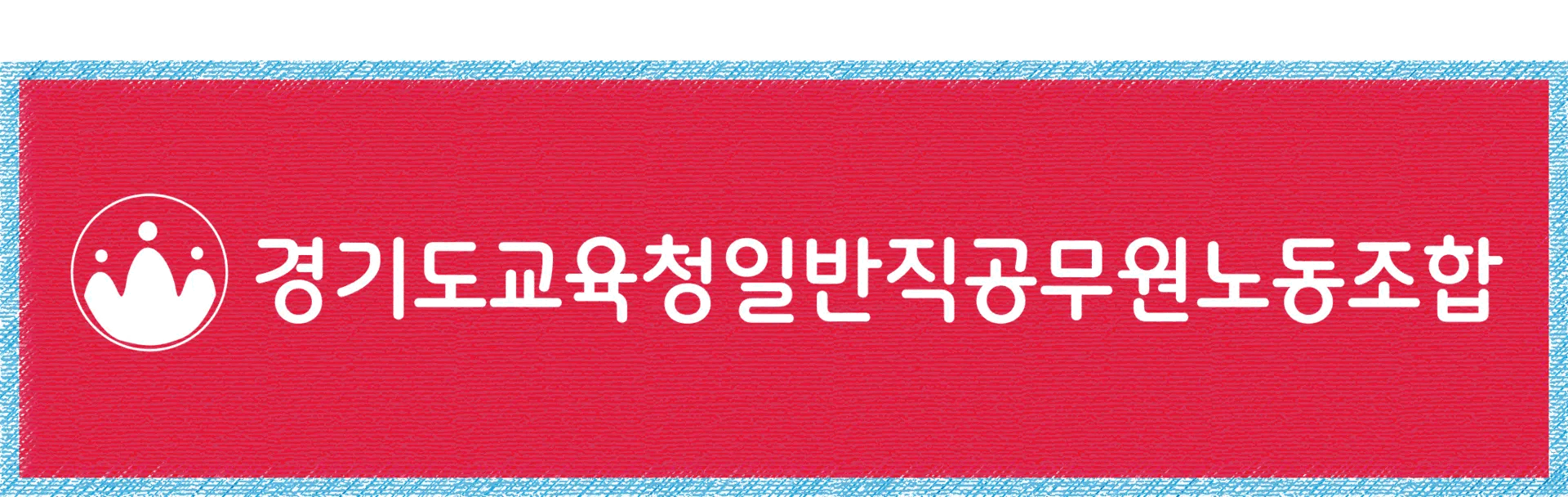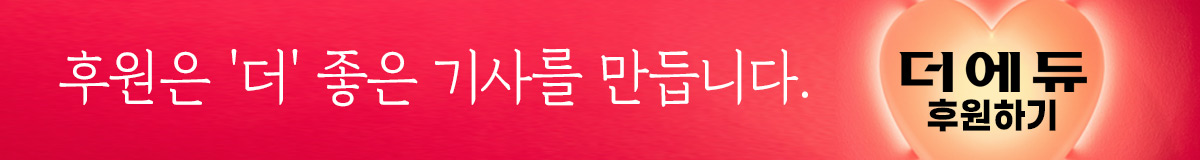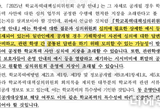더에듀 | 2026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 다가온다. 내일이면 세시풍속처럼 수능이 실시될 것이고, 경찰들은 시험장에 늦게 도착할까 봐 아이들을 태우고 고사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공무원들은 출근시간을 늦추고, 전국의 사찰들은 수능 100일기도를 결재하느라 법석일 것이다. 교회도 대목을 놓칠 리 없다. 외신들은 이런 기이한 국가행사를 송고하기에 바쁠 것이다.
이런 세시풍속은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고 풍속산업으로도 발전되어 온갖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이 끝나면 로데오거리는 거의 무법천지처럼 요란한 난장이 펼처질 것이다.
필자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열병을 앓는다. 그래도 될까?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아이가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스러질까. 한때는 입시 시즌에 한 명의 아이가 사라져도 병든 교육이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그런 열정도 다 소진되고 말았다. 세상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수능은 우리 교육의 선의(善意)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수많은 교육개혁안도 수능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980년대 이후로 정부들은 교육개혁을 표방했지만 그저 구호로만 남아 반복될 뿐이고 실체는 블랙홀에 파묻혀 사라졌다.
수능은 수학능력을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실제는 학력고사이다. 수학능력이 있어도 점수경쟁에서 밀리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학력고사라고 불러야 옳다.
학력고사라고 하면 성적순 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의 선발권을 부정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성적우수자는 대학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의실에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대학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고급 지식을 전수하고 또 연구하는 대학이 스스로 아이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학의 치명적 약점이다.
가르칠 자를 대학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학이 스스로 가르칠 자를 선택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없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능은 초중고 교육에서도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을 왜곡한다. 수능은 교육현장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밤 10시로 제한된 학원 수업 규제를 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횡행하는 것을 공식화하자는 것일 뿐이다.
무제한, 무한대의 경쟁이 아이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족쇄를 풀 능력이 없다. 어른들이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 나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여유를 갖고, 꿈꿀 시간도 갖고, 일탈도 경험하면서 크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