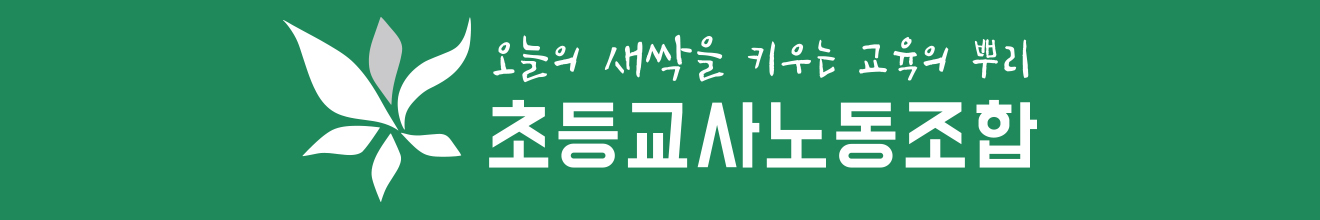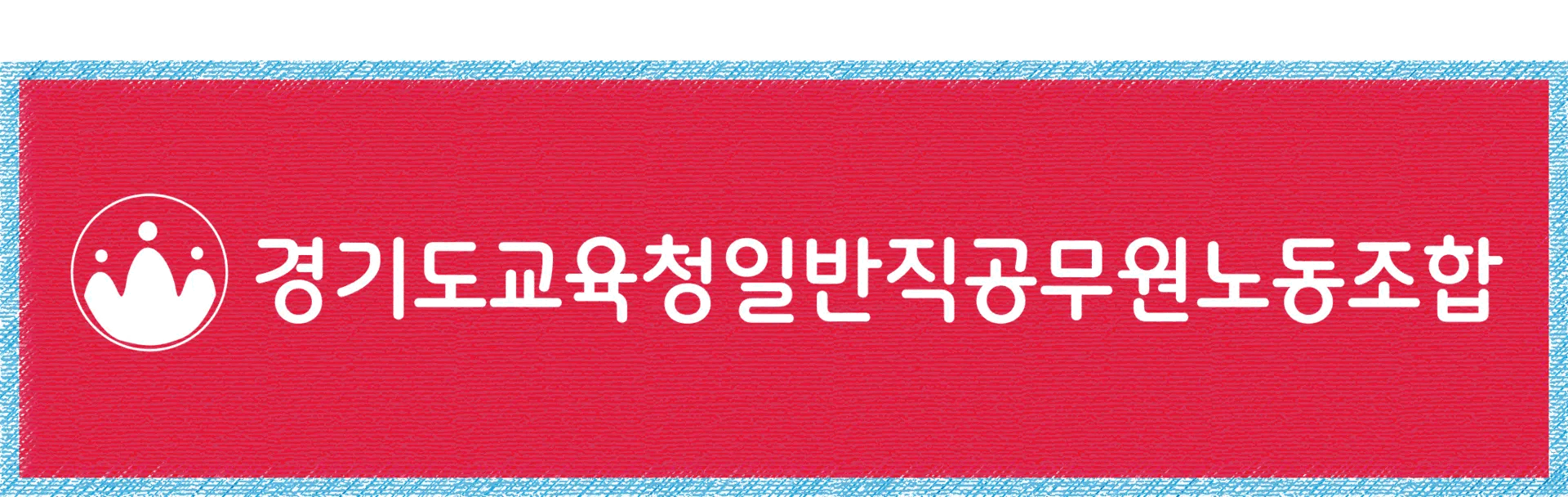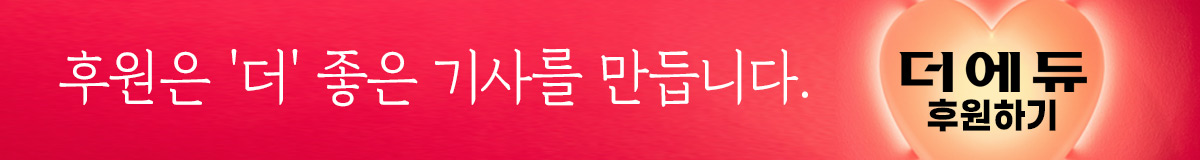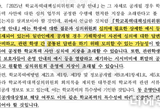더에듀 |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줄세우기와 능력주의는 나쁜 것인가’(2025.11.24.)를 잘 읽었습니다. 줄세우기와 능력주의에 대한 옹호의 글로 읽힙니다. 제가 최근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된 김성천 교수에게 수능 폐지 요구가 담긴 글과 배치되기에 제 의견을 남깁니다.
먼저 유럽의 여러나라가 대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성적주의와 줄세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 증거로 제시하는 많은 사례를 보며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특히 북구 삼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학업성적을 중시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조건에서는 고등교육의 수혜자선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별력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이라는 지표가 불가결합니다. 다시 말해 성적중심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량평가입니다.
하지만 대학은 정성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은 학업능력우수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인재도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에겐 정성평가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발견해 키우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 방식이 분명 필요하죠.
그런데, 수능은 정성평가 방식과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연계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초중등교육은 고등교육으로부터 절연될 때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교육책임을 초중등교육에 한정하고 싶지만 수능이 이를 어렵게 합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졸업후 대학진학 방식에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성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그 후 성적은 제로베이스에 두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적 자질을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대학을 그런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이고, 성적우수자가 반드시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세우기가 뭐가 나쁘냐는 비판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줄세우기를 지양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우선이죠.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국가가 수십만명의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