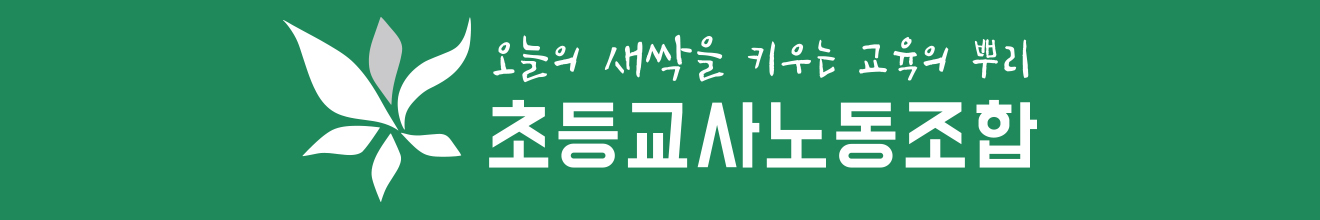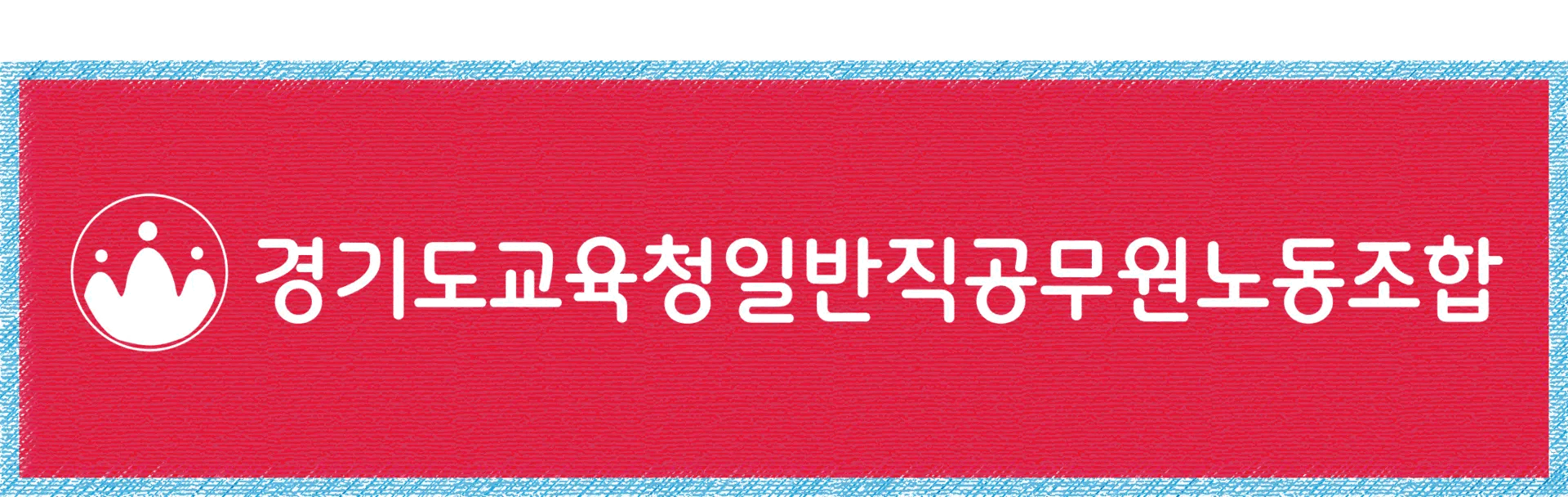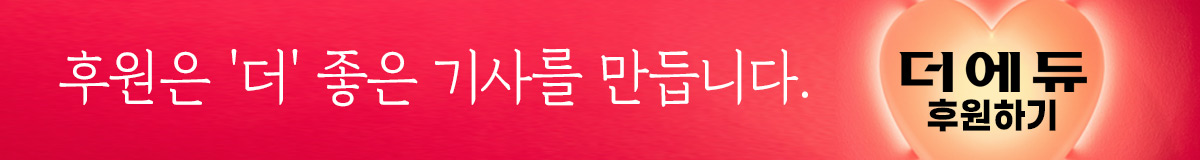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규정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계획의 시작일 뿐 아니라 마지막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만큼 학교 교육의 요체를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역사교육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교육과정은 정하는 주체의 교육 철학부터 정치 철학까지 담게 돼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올해 크고 작은 변화들이 한 해 동안 이어졌다. <더에듀>는 그 중 미국의 교육 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에서 선정한 7대 동향을 중심으로 미국 교육의 방향과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1. 공교육에 종교의 설 자리가 있는가?
미국 공립 교육의 역사가 교회 학교에서 시작된 데다 보수당인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기독교계인 만큼 교육과정 관련 정치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종교 관련 논쟁이다.
두 번째로 많은 학생 인구를 갖고 있는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성경 이야기를 초등 읽기 수업에 포함하는 새 교육과정을 승인했다. 반드시 성경 이야기를 강제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는 교육구에 학생당 40달러(약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법으로 장려까지 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초안이 나온 5월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성경이 미국 문화의 핵심 문서이며, 영어와 사회 학습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이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문화적 문해력 향상이 아닌 기독교 개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6월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종교적인 자료를 가르치도록 권고한 데 이어 7월에는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교실에 미국 헌법, 독립 선언문과 함께 성경을 의무적 교육자료로 명시했고, 5~12학년 학생들에게 성경이 서구 문화와 미국 역사에 끼친 영향을 가르치도록 했다.
비록 법원에서 위헌으로 이달 결정됐지만,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지난 6월 십계명을 교실에 비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논쟁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임기 때도 학교 내 ‘기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침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중에 십계명 비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속 교육이 공립 교육의 기반이라 이런 논란이 덜하지만, 중등 교육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사립학교 중 종립재단이 많고, 건학 이념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관련된 논쟁은 지속되고 있어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2.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 금지 법안 확대 주춤
미국에서는 찬반 논쟁이 심각한 ‘분열적 개념((Divisive Concept)’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입법되는 추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첫 임기 당시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후 탄력을 받았다.
일례로 인종 차별의 내재적인 가능성을 전방위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젠더 이론이 있다.
최근 3년간 18개 주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아예 특정 개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금지하기까지 하는 법안을 입법하거나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올해는 앨라배마주와 유타주 단 두 개 주에서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흐름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앨라배마주는 2021년에 이미 ‘인종이나 성별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개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다양성, 평등, 포용 사업이나 담당 부서를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원 모두 분열적 개념을 배우는 것을 금지했다.
유타주도 2021년에 교사들이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을 다룰 때 ‘학생이 가정에서 배운 신념이나 가치, 기준을 의심하도록 강요하는’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는 ‘개인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차별적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연수에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서나 직원을 두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이런 논란은 다시 어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종 관련 논란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성별이나 젠더 관련 이슈나 논란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거세다.
또한, 학부모 권리 단체가 입법 압력 단체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과정 구성 개입이 늘어나는 미국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어떤 방향의 움직임이 있을지 미국의 논쟁을 통해 미리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직접 교수 중심 문해 교육 확대
영어권에서는 문해 교육의 방법론 변화가 큰 이슈다. 지난 20년간 유행했던 ‘균형적 문해(Balanced Literacy)’를 폐기하고 ‘읽기의 과학(Science of Reading)’을 채택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균형적 문해’는 자연적인 언어 학습이 이뤄진다는 관점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80~90년대의 총체적 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과 음운 직접 교수를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0년대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음운 구성에 대한 직접 교수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각자 흥미가 있는 본문 위주로 읽기를 연습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꼭 음운 구성을 몰라도 그림, 문맥에 따른 추측 등을 사용해서 단어를 알아내고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균형적이라고 하지만 기본 바탕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 직접 교수를 일부 더한 정도다.
그런데 이런 교수법의 효과성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갈수록 문해율이 저하되자, 부각된 방법이 ‘읽기의 과학’이다. 모든 학생에게 같은 본문을 음운 직접 교수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균형적 문해’ 교육은 금지하고 ‘읽기의 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만 허용할 정도다.
이런 방향 전환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뤄지고 있었다. 2013년 미시시피 주가 문해 교수법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하고 2019년 그 효과성이 입증되자 많은 주 또는 개별 교육구들이 뒤따랐다.
올해도 6개 주가 ‘읽기의 과학’ 대열에 동참했다. 메릴랜드주는 모든 학교가 ‘읽기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교수를 하도록 요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몬트주, 뉴저지주, 미시간주, 아이오와주 등은 이를 교사 양성·연수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고, 문해교육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이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 교육구도 지난해 도입을 시작해 올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읽기의 과학’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채택했다.
한글은 영어와 달리 음운 교육은 쉽지만, 교수법의 관점에서 직접 교수를 낡은 방식으로 대하던 흐름에서 북미의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는 연구자와 교사도 늘고 있다. 직접 교수를 강조하는 영어권의 흐름이 우리 교육에 끼칠 영향은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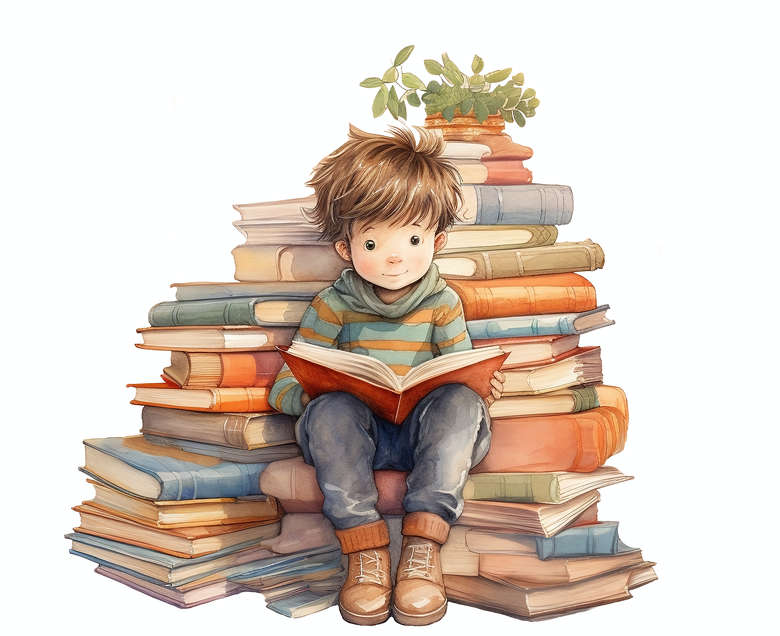
4. 청소년 문해에 대한 관심 요구
앞서 언급한 문해 교육 변화는 주로 초등의 초기 문해 교육 중심의 사안이다. 그러나 갈수록 고학년 학생의 문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8월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483명의 교사 중 44%가 학생들이 내용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고, 79%가 읽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때문에 최소 주 1~2회 내용을 조정해야 했다. 이에 앞선 4월 연구 보고서에서도 중등 교사의 22~40%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문해교육에 자주 시간을 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문해 프로젝트(The Project for Adolescent Literacy)에서 8~9월에 걸쳐 539명의 6~12학년 교사, 문해 지도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54%)이 소속 학교가 학생들의 기초 문해 교육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아직 기본 문해 교육 자체는 큰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 문맹률 논란은 있다. 특히, 주로 어휘에 한정돼 있지만, 청소년 문해력 저하에 대한 비판도 매년 나오고 있다.
5. 수학 교수법 논란: 암기와 반복 연습 vs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논란은 암기와 반복 연습을 중심으로 할지,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이 초점이 될지 양자 간의 대립으로 이뤄져 있는 해묵은 주제다. 물론 현장에서는 대부분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7월 가장 많은 학생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수학 교육 체제를 승인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수학 교육 체제는 학생들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생활 상황에 수학 지식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흑인 등 특히 수학에서 취약했던 인종을 위한 문화적인 관련성도 높이도록 했다.
이런 방향은 지난 2021년 초안이 공개된 이후 3년간 지속됐다. 스탠퍼드대, 버클리대 등 유명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연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용했다는 지적까지 일었다. 결국 위원회는 최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승인했지만, 여전히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탐구 중심의 수학 교수법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읽기의 과학’을 본떠 ‘수학의 과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문해와 마찬가지로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직접 교수와 단계적인 연습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흑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 반응적 접근에 대해서도 오히려 수학을 정치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데이터 관리를 강조한 고교 교육과정도 대수 대신 데이터 관리를 배운 학생은 향후 STEM 전공을 위한 기초 학습이 안 돼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앞서 뉴욕시 교육구에서도 6월 문제 해결과 학생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수학 교육과정을 채택했다.
수학 교수법의 전환 역시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프랑스와 캐나다에서도 더 체험적이고 실생활에 가까운 방식의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도 실생활 문제 해결력 함양을 내세우고 ‘의미를 느끼게 한다’는 캘리포니아의 취지와 상통하는 ‘즐겁게 생각하는 수학’을 내세웠다. 상당수의 연구자와 교육자가 의문을 품고 있는 수학 교육의 흐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진로와 직업 교육 강조
내용과 온도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결국 노동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준비 혹은 진로 교육의 강조다.
미국의 주 정부 간 협약에 따른 비영리단체인 국가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는 지난 3월 41개 주 주지사 연설문 중 36개가 진로, 기술 교육, 노동력 양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2월 진로 및 기술 교육 협회(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와 진로·기술교육 향상(Advance CTE)이 공동으로 한 조사 보고서는 지난해에 47개 주가 115개 관련 정책을 내놨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교육부 장관 후보인 린다 맥마흔도 노동 인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후보자 발표가 있던 날 “성공적인 진로를 위한 경로”라면서 트위터(X)에 스위스의 도제 모델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진로를 위한 준비를 목표로 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내년 예정돼 있다. 또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새로운 직업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볼 수 있겠다.
7. 교실 내 정치 언급 감소
미국에서는 선거철이 될 때마다 사회 교사들은 후보와 이슈 등 선거를 교육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기보다는 선거의 절차를 가르치고, 과거에 있었던 논쟁들에 대한 일차 사료를 제공해 학생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와 관련한 논란을 피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그마저도 감소한 추세다. 에듀케이션 위크 연구소가 지난 7월 423명의 교사를 포함한 678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58%의 유·초·중등 교사는 선거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53%는 “교과와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지만, 나머지 22%는 “학부모의 민원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9%는 “학생들이 신중한 토의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논란을 피하고자 언급을 피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학부모도 학생도 민감하기 때문에 교사는 소위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철에 ‘정치 교사’의 오명을 피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선거를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