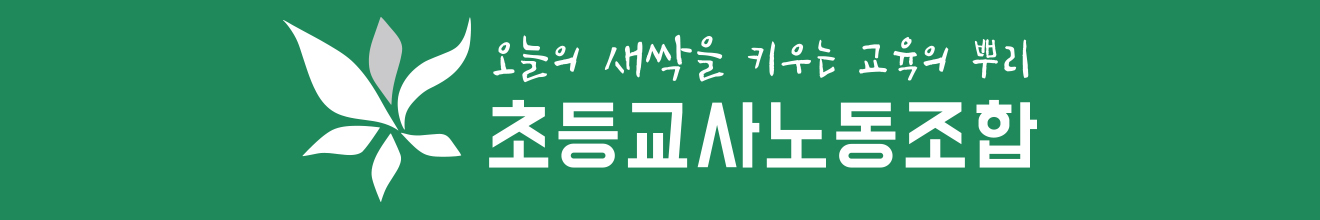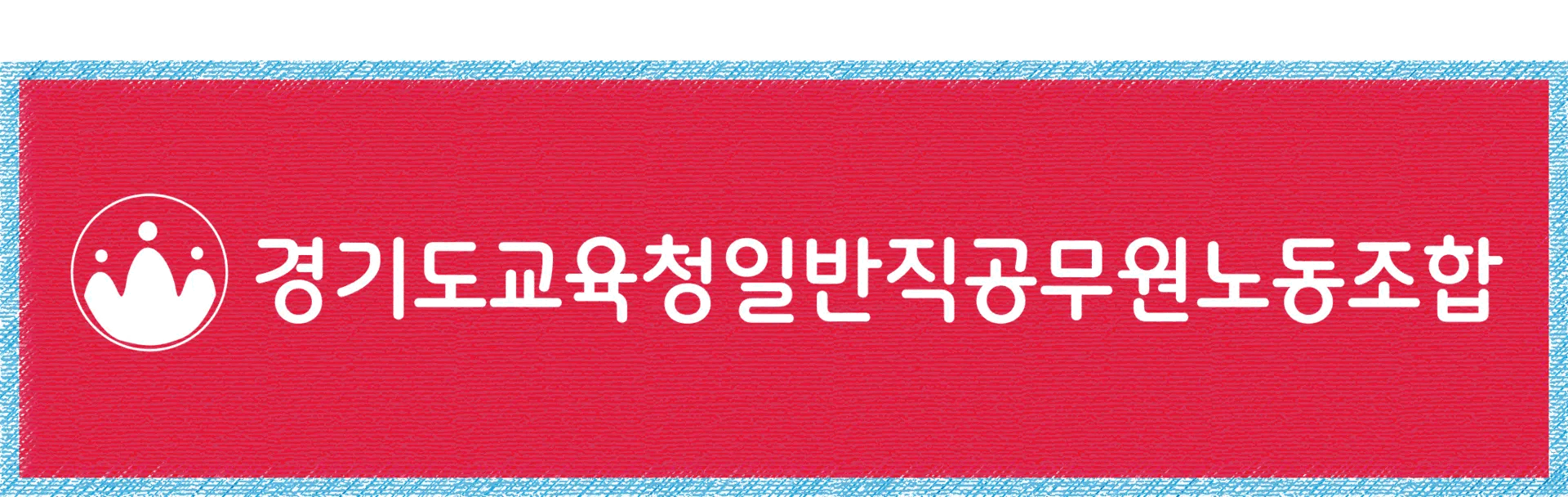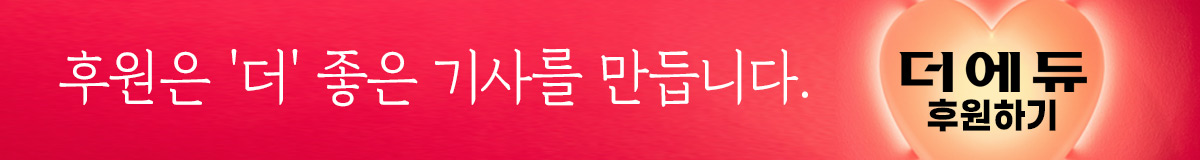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우리가 병들고 아픈 이유는 위태롭고 열악한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의 몸을 스스로 열등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게 만든 건 사회가 부여한 낙인도 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픔’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상처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견디라”는 말을 너무 쉽게 던진다.
큐어링랩은 ‘범죄 피해 생존자의 고립’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피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얼마전, 누군가 내게 말했다.
“그런 PTSD도 장애 아니에요?”
내 페이스북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해서 혜택이라도 받으라”는 댓글도 달렸다.
그때부터 생각했다. ‘심리적 아픔은 정말 ‘장애’일까?’
오늘날 ‘장애’라는 단어는 농인이나 맹인 같은 신체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신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쓰인다. 하지만 장애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온 사회적 개념이다.
킴 닐슨의 『장애의 역사』에 따르면, 장애(disability)라는 단어는 ‘부재’를 뜻하는 dis와 ‘능력’을 뜻하는 ability가 결합된 말이다. 곧,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누가 능력 있는 몸인가’를 정의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져왔다.
토착민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정의되었다.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누구도 무능하다고 낙인찍지 않았다. 물을 긷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 사냥을 하는 일. 그 어떤 노동도 공동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들어와 전쟁과 경쟁이 일상이 되면서, ‘능력 있는 몸’은 강하고 민첩한, 전투에 적합한 몸으로 규정되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는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다.
‘낙인(stigma)’이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나 범죄자의 몸에 인두로 찍은 표식에서 비롯되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신체적 증표였다.
오늘날 낙인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결합된 형태로 작동한다.
심리적 질환을 가진 우리에게 붙는 낙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낙인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
첫째,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고정관념. 둘째,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라는 편견. 셋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나약해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시혜적 시선. |
무능함, 위험함, 나약함. 이 세 가지 낙인이 우리의 심리적 아픔을 더욱 깊게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종종 ‘엄살’이나 ‘의지 부족’으로 오해받고, 그 결과 도움을 요청할 기회조차 빼앗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인간일지라도 PTSD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지지는 필수적이다. 사회적 지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가족, 친구, 동료로부터 받는 심리적·물리적 자원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생존의 장치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과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을 줄일 뿐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트라우마는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그 흔적이 평생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전체 PTSD 환자의 약 30%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충분한 지지와 치료를 받는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상’으로의 복귀인가 혹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회복인가?
심리적 아픔을 장애로 규정해야 하는가 혹은 인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