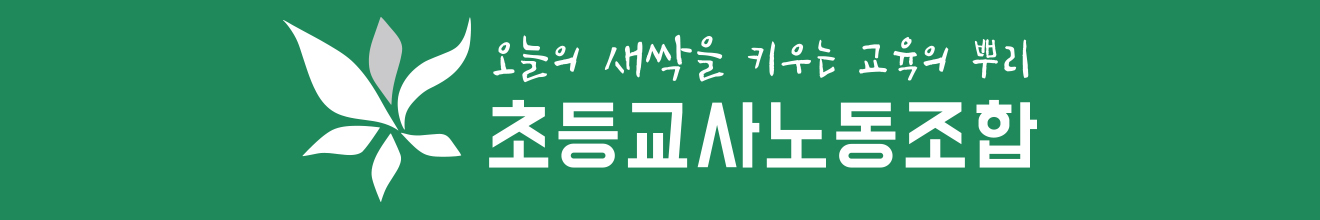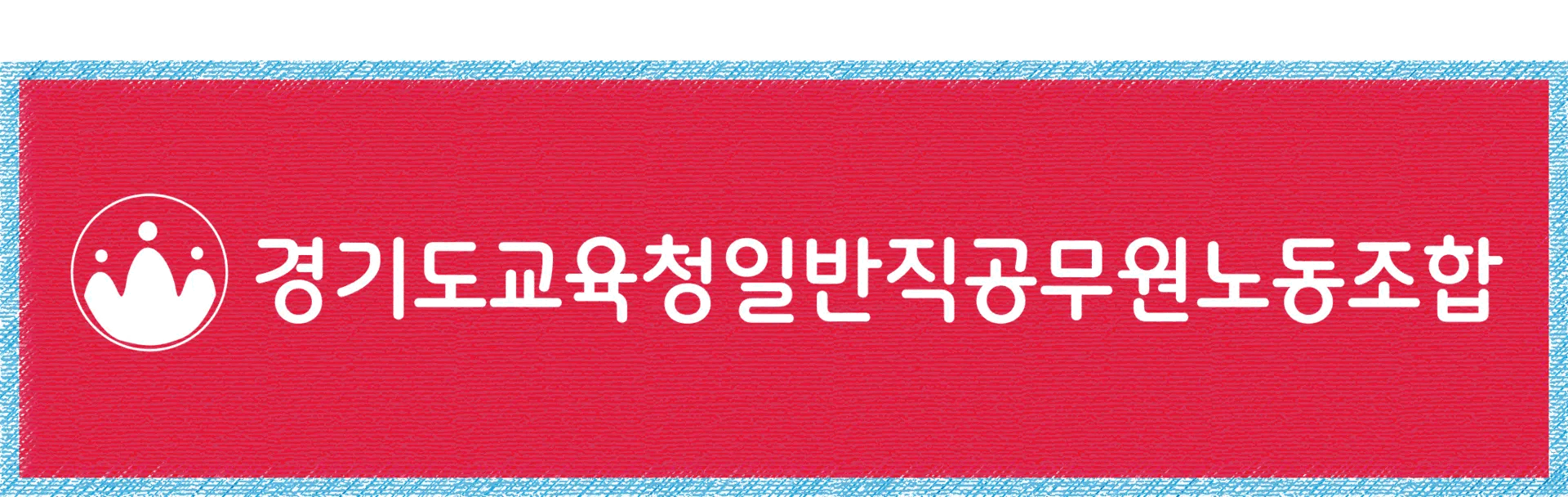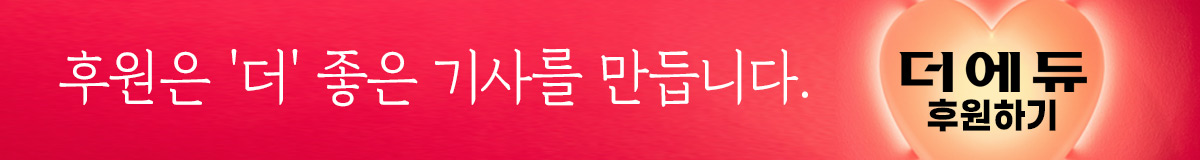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
더에듀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지난 9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편견 극복 사례 ▲교과 및 다양한 활동과의 융합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해 현장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수업이 끝나자, 교실 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우리 집에서 시 쓸 사람?”
순간 귀를 의심했다. 주말에 자기 집에서 시를 쓰자고 친구들에게 한 제안이었다. 장난이 아닌,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교실이 금세 웅성거리더니, “나도! 나도!” 하며 여기저기 손이 올라가고 교실이 순식간에 즐거운 소란으로 가득 찼다.
낯선 광경이었다. “우리 집에서 게임 할 사람?”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나이가 아닌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여 글쓰기를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대부분 학생에게 글쓰기는 하기 싫은 과제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원래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인간의 뇌는 몸의 2%에 불과하지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관이다 보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꺼린다. 누구나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다. 아이들에게도 글쓰기는 일기, 독후감, 감상문 등 학교에서 주어지는 숙제일 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실력이 늘기는 힘들다. 게임과 같이 재미있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글쓰기가 즐거운 경험이 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을 줄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도구는 글쓰기 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많은 아이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AI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할 수 있다.
그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시를 쓰고, 학생들이 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AI가 그리도록 하는 ‘시화를 만드는 활동’을 했다. 시를 쓰는 것에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AI를 이용하는 것이 신기한지 흥미를 보였다. AI에게 그림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시가 필요한 데, 다른 사람의 시보다는 자신의 시로 만들고 싶다 보니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시를 쓰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시를 작성한 후 AI에게 시화를 그리도록 하자, 교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AI는 마치 마법의 팔레트 같았다. AI가 학생들의 시를 물감 삼아 예상치 못한 그림을 그려내자, 화면 속 펼쳐진 이미지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자신의 시가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자 흥미가 커졌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왁자지껄 떠들며 친구들의 작품에도 반응했다. AI가 만드는 시각적 결과물이 글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날려버린 듯했다.
모든 학생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한 학생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얘가(AI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AI가 붕어빵을 그려내지 못한 것이다. 또 한 학생은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라 속상해했다.
AI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AI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첫 번째 학생에게는 붕어빵을 본 적 없는 AI가 상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했고, 두 번째 학생에게는 고양이가 어떤 얼굴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귀여운지를 설명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AI가 알아듣도록 세밀하게 묘사하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다. AI가 내 맘 같지 않다 보니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고, 끈기도 필요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빠져들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사전을 찾아보고 AI를 이용하여 더 나은 표현을 탐색했다.
그러자 화면 속 그림이 점점 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깨달았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더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AI를 이용하며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다. 글을 더 쓰고 싶어 했다. 그 결과가 “우리 집에서 시 쓸 사람?”이라는 외침으로 나타났다. AI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AI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한편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교사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AI가 교육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활용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결국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AI는 도구일 뿐이다. 칼도 잘못 쓰면 무기가 되고 잘 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AI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지식과 경험 없이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안다면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AI는 낯설고, 활용 경험도 부족하다. 하지만 10년 후, 경험이 축적된 교사와 학부모에게 AI는 교육 현장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년 후에는 ‘AI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조차 의미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AI를 두려워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교육적 활용법을 연구하며, 실제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도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