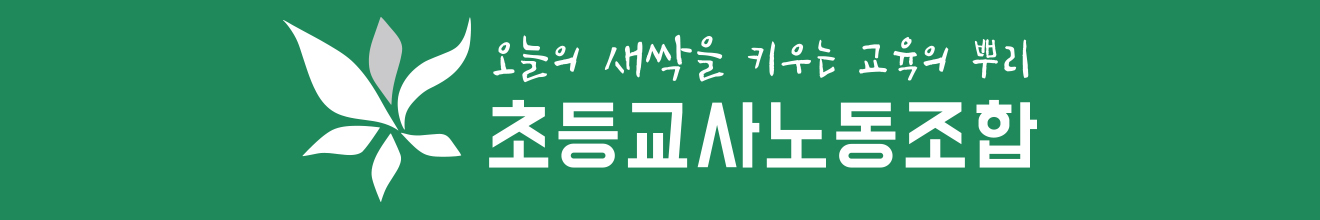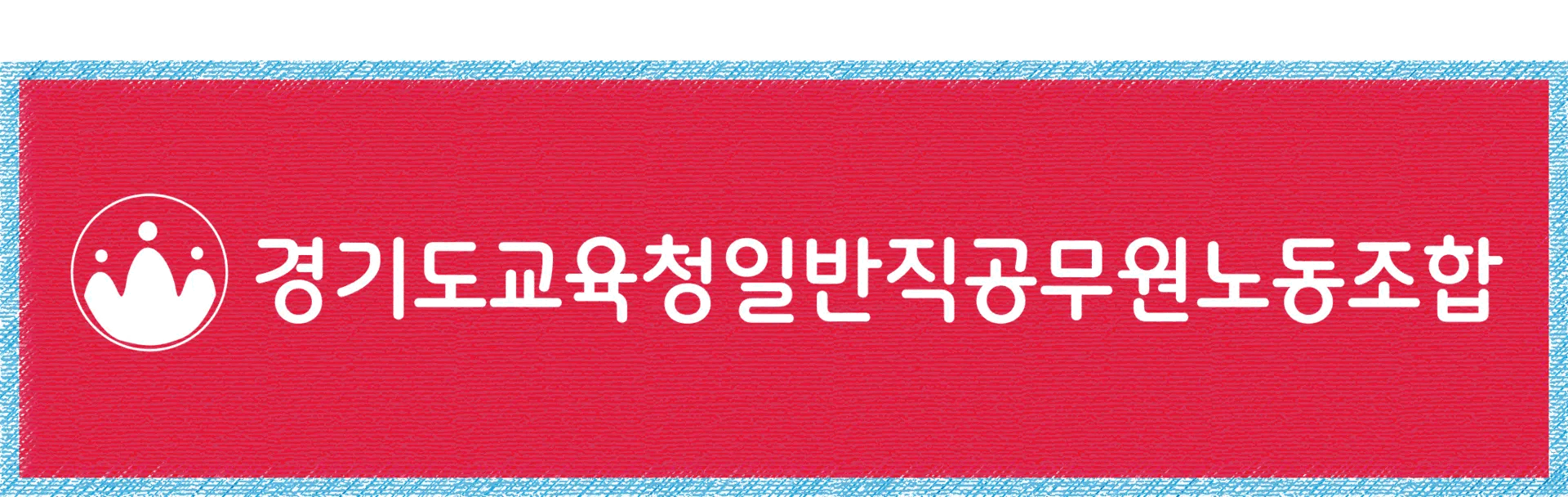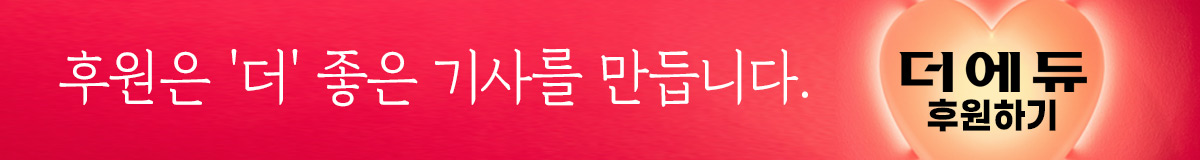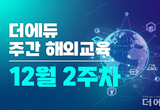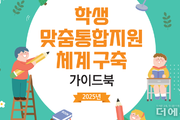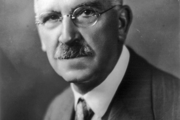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는 지난 26일 미국의 교육 전문지 주간 교육(Education Week)의 보도를 인용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많은 초등학생, 읽기와 기억력 수준 낮아”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30)
요즘 증가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인지 발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비교적 큰 규모의 추적 연구인 만큼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에서 원문을 확인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저연령화...뇌인지 발달 영향 규명은 부족
연구 결과는 제이슨 나가타(Jason M. Nagat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량 변화와 인지 기능(Social Media Use Trajectorie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Adolescents)’이라는 제목의 연구 서한으로 13일 발표됐다.
연구 서한은 보통 연구 논문보다 간략한 형식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략한 만큼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주로 예비 연구나 확증 연구를 담는다.
연구진은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10대 초반의 초기 청소년기 삶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간 심리·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나왔고, 스크린 타임과 뇌인지 발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비록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도 많지만, 소셜 미디어에 한정해 인지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많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진은 이런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미국의 ‘청소년 뇌인지 발달 연구(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 Study, ABCD Study)’ 데이터를 이용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 급증 집단은 6% 수준
연구는 9~13세의 청소년 1만 1875명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 전역에 21개 지역에 분포한 데이터를 확률 표본으로부터 무작위로 표집을 시행했다. 이 중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표본을 제외하고 6554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기준선 시점(2016~2018년, 8~11세), 1년 차(2017~2019년, 9~12세), 2년 차(2018~2020년, 10~13세) 등 세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소셜 미디어 이용량 변화 양상을 살폈다.
소셜 미디어 이용량은 평일 평균 사용 시간과 주말 평균 사용 시간에 가중치를 달리 둔 다음 일일 사용 시간을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 양상을 추정해 9세부터 13세까지 변화 궤적을 산출한 다음 저사용 집단, 사용, 사용 점증 집단, 사용 급증 집단으로 나눴다.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13세까지의 변화 궤적을 추정한 데는 집단 기반 궤적 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사용했다. 이 모형은 집단별로 개인의 변화나 상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변수의 궤적을 기반으로 개인을 잠재 집단으로 분류한다.

저사용 집단은 0.3시간 이내로 증가한 집단(58%)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이 적은 청소년이었다.
점증 집단(37%)은 13세 시점에 일일 1시간 정도 사용량이 늘어난 청소년이었다.
급증 집단(6%)은 13세 시점에 일일 3시간 정도 늘어난 집단이었다.
이 중 저사용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했다.
선형 회귀분석으로 인지 기능 검사 점수 비교
집단별로 기준선과 2년 차 인지 기능 검사 수행 결과를 비교했다. 인지 기능 검사는 ABCD 연구의 기본 시행 사항인 미국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인지 평가 도구 모음(NIH Toolbox Cognition Battery) 결과를 사용했다.
이 평가 도구 모음은 주의력, 문자 해독, 수용적 어휘력, 기억력, 정보처리 속도 등에 관한 검사로 구성돼 있다. 점수는 연령에 따라 평균적인 인지 능력을 평균 100점(표준편차 15)으로 하도록 보정됐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제한 변수들인 공변량은 성별, 인종, 가계 소득, 부모 학력, ADHD 증상 유무, 우울증 여부, 다른 스크린 타임, 지역 그리고 기준선 시점에서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회귀 분석을 통해 공변량을 통제하고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폈다.
문자 해독, 기억력, 수용적 어휘력 점수 ‘조금’ 낮아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 사용 점증 집단은 문자 해독(-1.39), 기억력(-2.03), 수용적 어휘력(-2.09)과 종합 점수(-0.85)에서 준거 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의력(-0.67)과 처리 속도(0.65)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급증 집단은 문자 해독(-1.39), 수용적 어휘력(-3.85), 기억력(-4.51)과 종합 점수(-1.76)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보 처리(1.61)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p값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검사가 같은 표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편차가 큰 경우 이렇게 된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스크린 타임이 청소년의 인지적 수행력에 부정적 연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보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차이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 앞서 살폈듯, 미국 보건연구원 인지 평가 도구 모음의 표준 편차를 15로 봤을 때 1~5점 사이의 차이는 확실히 다른 수준이라고 말하기 힘든 차이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작은 차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댄 플로렐 이스턴 켄터키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미한 차이이며,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많다”면서 “특히 대부분 학생이 저사용 그룹에 속하며, 아동 대부분이 평균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스크린을 단순히 스크롤하고 짧은 문장만 읽을 때 언어 발달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미국 주간 교육지에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의 기회비용일 가능성도
다만, 연구진도 큰 차이는 아닌 점을 논의에서 인정했으며, 소셜 미디어 사용이 다른 교육적 활동과 학교 공부를 대체한다는 기존 연구를 들어, 소셜 미디어 자체의 영향이 아닌 유의미한 교육적 활동 감소의 영향일 가능성은 언급했다.
연구 서한 외의 인터뷰에서는 교육적 활동 말고도 수면이나 휴식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내용과 사용 환경이 더 복잡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계속 앱을 전환하고, 끊임없이 알림을 받고, 짧은 영상을 보는 활동이 뇌에 영향을 끼쳐 집중을 힘들게 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홍수가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일으켜 깊은 사고나 문제해결을 위한 여유를 남겨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도 인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인정
이번 연구는 단순히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한 것에 그치는 점도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게 한다. 소셜 미디어와 인지 평가 점수 사이의 인과나 효과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관도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떤 인과도 직접적인 영향은 입증할 수 없는 연구인 셈이다.
연구진도 “관찰 연구라는 디자인이 소셜 미디어 사용량 변화가 낮은 인지 성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추론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 일부 언론에서 쓴 제목처럼 “SNS 많이 쓸수록 기억력 떨어진다”는 주장은 이 연구를 통해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부 공변량을 통제했다고 하지만, 공변량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잠재적 잔여 교란 요인”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꼽기도 했다.
또한,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의 정의도 정교하지 않다. 통칭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자기 응답으로 시간을 분석한 것이므로, 응답자마다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에 따라 영상, 채팅, 이미지, 단문 등 주로 사용되는 수단이 다른데 각 소셜 미디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의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
연구진도 논의에서 소셜 미디어에 관한 자기 응답 데이터를 한계로 꼽았다. 이 때문에 향후 연구를 위해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인지적 성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도 “연령 규제 하향” 지지
이런 연구는 보통 좀 더 세세한 후속 연구 설계를 위한 방향성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입증된 인과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인과 입증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스크린 타임과 인지적 기능으로 보지 않고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기억력이나 어휘력이나 문해력을 특정해 인과를 분석해 볼 여지를 여는 것만으로도 연구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어떤 인과도 입증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연구진은 제언에서 “더 엄격한 연령 규제”에 대한 지지를 시사한다고 했다.
한 가지 이유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 주간 교육지와 나가타 교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 미미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연구는 2년에 걸친 조사일 뿐”이라면서 “더 긴 기간에 더 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의미 있는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특정 인지 능력과 상관도 인과도 있다고 입증되지는 않았어도 인과 검증도 포한한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입증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결과를 더 보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자체에서 나타난 점수 차이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던 플로렐 교수도 소셜 미디어 사용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 연구 자체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어도 이를 입증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가타 교수 연구팀의 연구는 입증한 인과는 없어도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확증 연구이자, 향후 좀 더 세밀한 연구의 방향을 발견한 예비 연구로서 가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