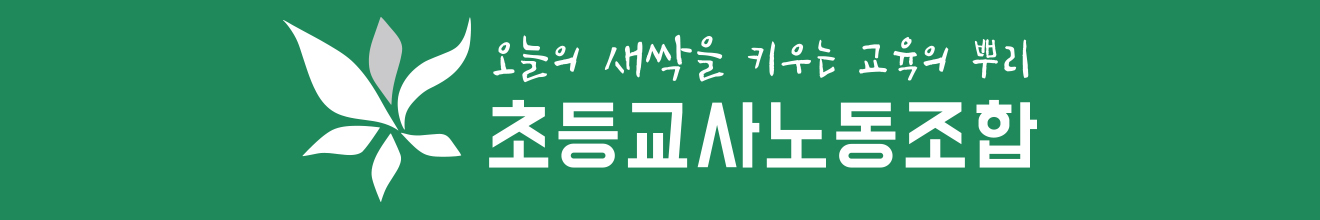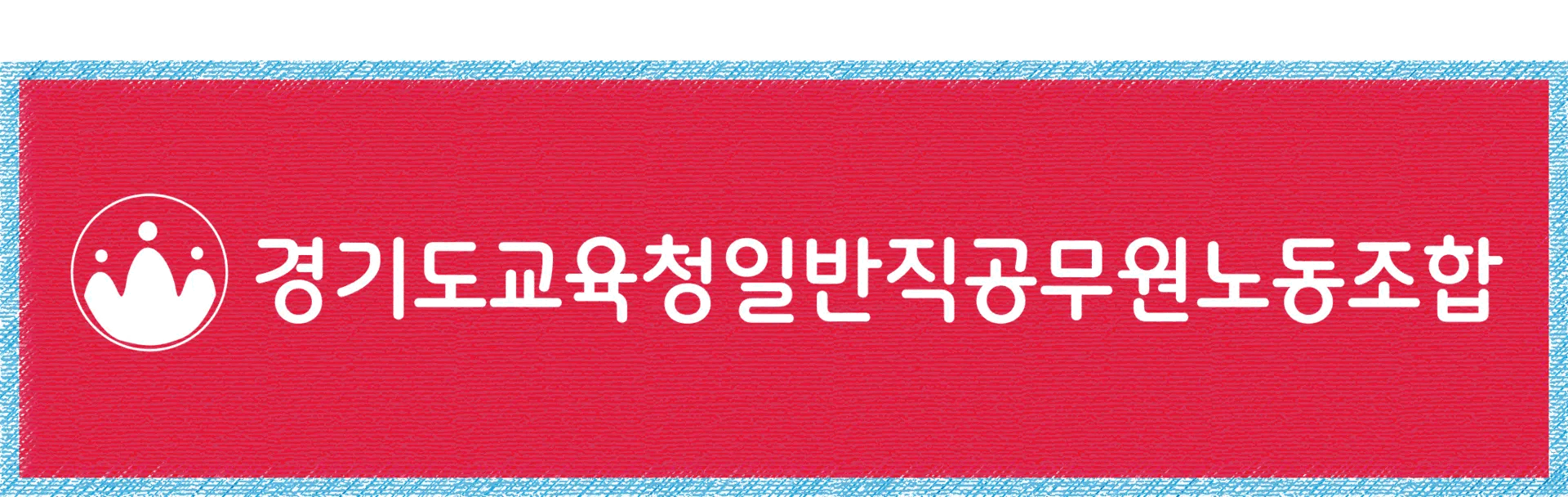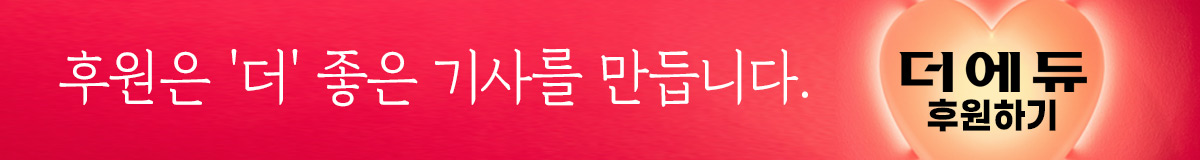|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 |

교사로서 수 십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아오다 퇴직의 순간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퇴직과 동시에 17일 급여는 멈추게 된다. 연금 개시일까지 말이다. 교육공무원 연금 개시는 65세부터이다. 어찌어찌 정년까지 버티고 버텨 겨우 정퇴를 했는데 연금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연금 개시일까지 3년이나 남았다.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일은 없다.
소득 크레바스(=빙하 골짜기 깊은 틈)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는가? 소득 크레바스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공백기간을 말한다. 연금도 연금이지만 공백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노후 준비는 셀프였다. 무엇이든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빨리하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공부도, 재테크도,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하자. 그래야 조급해지지 않는다.
부자샘은 노후 준비를 40대 초반에 부동산 자산으로 끝냈다. 부자샘은 본인 집 말고도 수익형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고도 안주하지 않고 미리미리 자기 계발을 한다. 기술 관련 자격증에도 도전한다. 노후에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안정된 직장과 연금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짱이처럼 사는 것이 퇴직까지 행복할 수 있어도, 이후의 삶은 다시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
제2의 직장을 갖는 것도, 새로운 사업도 좋다. 자신의 역량을 키워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자세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글을 잘 쓰면 글 작가로 전향하고, 투자를 잘하면 전업 투자가도 좋고, 작은 카페와 편의점도 좋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나쁘지 않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기대수명 100살 중 겨우 20년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80년을 산다면 너무 우려먹는 것 아닌가?
|
◆ 연금 받는 사람들의 3가지 소득 형태 ① 연금 근로: 연금도 받으면서 근로 소득 → 원로 기간제교사, 사업, 취업, 아르바이트 등(단, 근로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줄어듦) ② 연금 임대: 연금을 받으면서 + 임대업(부동산 임대) + 금융소득(금융 이자 수익 ③ 연금 맞벌이: 둘 다 연금 받는 부부(연금 맞벌이), 주로 부부 교사 |
20년 미만 교육공무원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이 내 노후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이런 기조로 연금개혁은 또 한차례 이루어질 예정이다. 누구의 손으로 해야 할지 서로 미루고 있을 뿐 폭탄 돌리기처럼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분명 연금 개혁은 이루어질 것이다.
33년 연금을 납부하면 2000년 초 초임 발령 받은 사람 기준 연금액은 월 150만원 정도 예상한다. 물가 상승률 등을 따지면 150만원의 화폐가치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새우깡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는 만 65세라고 했다. 그렇다면 만 65세 이후 평균 연금 수령기간은 과연 얼마일까? 생각 외로 평균 수령 기간은 평균 7.5년 정도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늘 익숙한 평균의 법칙이다. 이 기간보다 평균 수령 기간이 적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만일 연금 대상자가 사망으로 연금 지급 사유가 사라지면 배우자나 직계에서 일정 부분 연금이 지급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사자의 이야기니 연금 수급자가 수십 년 동안 일한 것에 비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23년 한국 총인구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은 30%라고 한다. 85세는 15%로 떨어진다.

“안정에 성급히 삶을 걸지 마라.”
김난도 교수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나온 말이다. 참~ 멋진 말이다. 안정감은 삶에 평온함을 준다. 인간은 늘 안정과 평온함을 찾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안정과 평화 속에서도 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에서는 개미의 삶이 옳은 삶이라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베짱이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개미로 사는 삶의 모습이 베짱이 삶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수천 년 전에 쓰인 이솝우화가 지금까지도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다.
교사=안정감=성취=종착점이라는 생각은 버리자. 교사가 되었다고 안정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되었다고 인생의 진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직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제2의 직업 준비도 이제는 필수다.
앨랜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