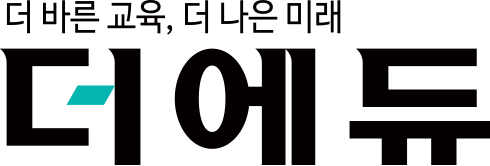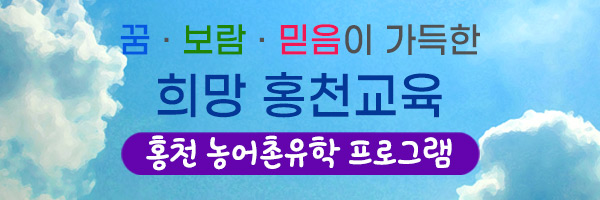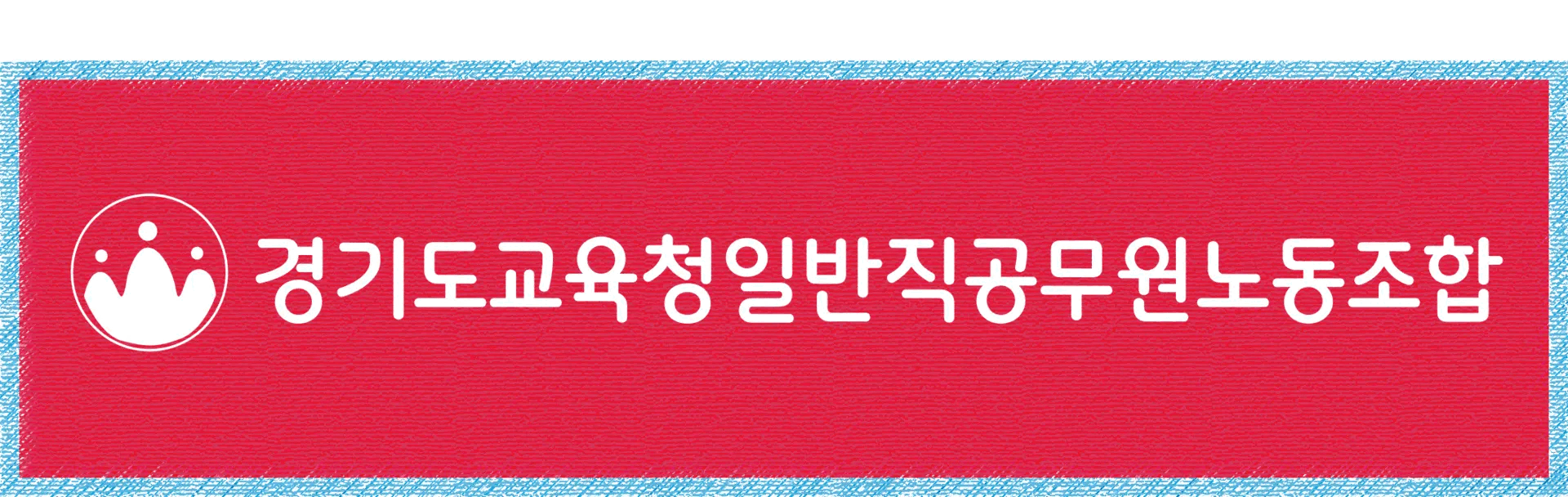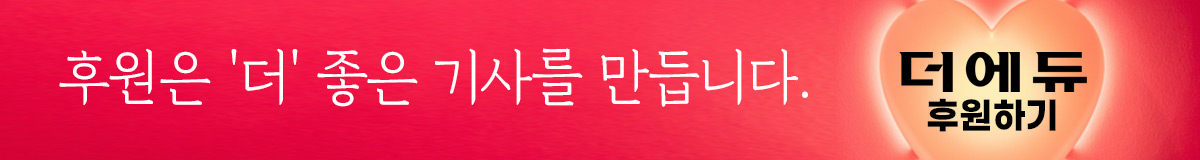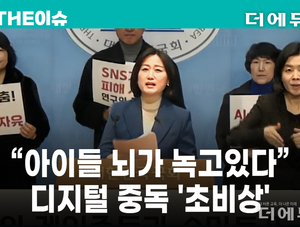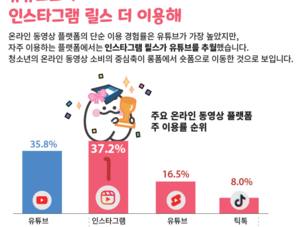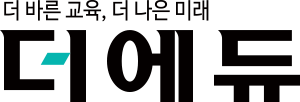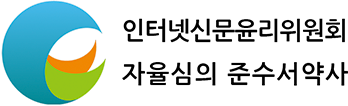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업 중 휴대폰을 하던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되려 묻는다. 눈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고, 주위를 둘러봐도 친구들 역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표정이다. 단지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훈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훈육’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고 거북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지금 우리는 ‘훈육’이 사라진 첫 세대를 키우고 있다. 경계를 몰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누구도 그 아이를 ‘꾸짖지 않는다.’
그 결과, 아이들은 어른의 지시를 ‘강요’로, 규칙을 ‘선택’으로, 책임을 ‘남 탓’으로 받아들인다. 가르쳐야 할 태도는 사라지고, 배려와 책임의 언어는 교육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감정을 우선하고, 자존감만을 강조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면역력을 주지 못했다.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이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기분이 나쁘다고 모든 지적이 ‘폭력’이 되는 순간, 사회는 누구도 훈육할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잘못을 지적당하면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다툼이 생기면 ‘상대가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계를 끊는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채, 피하거나 외면하는 문화.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단절로 이어진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국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이다.
훈육은 억압이 아니다. ‘훈육’은 아이에게 경계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며, 관계 속에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다. 무례를 지적해 주는 어른이 사라진 사회에서, 아이는 정중함을 배울 수 없고 실패를 조율해 주는 교사가 없는 교실에서는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지금 우리는 훈육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지식보다 먼저’, ‘인성보다 깊게’, 태도와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꾸짖는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아이들이 자기 말에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말을 책임질 줄 아는 훈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는 본능이지만, 책임은 배워야 한다. 훈육은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