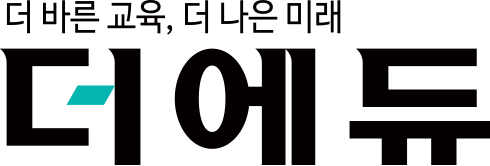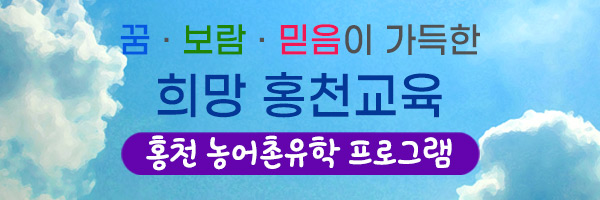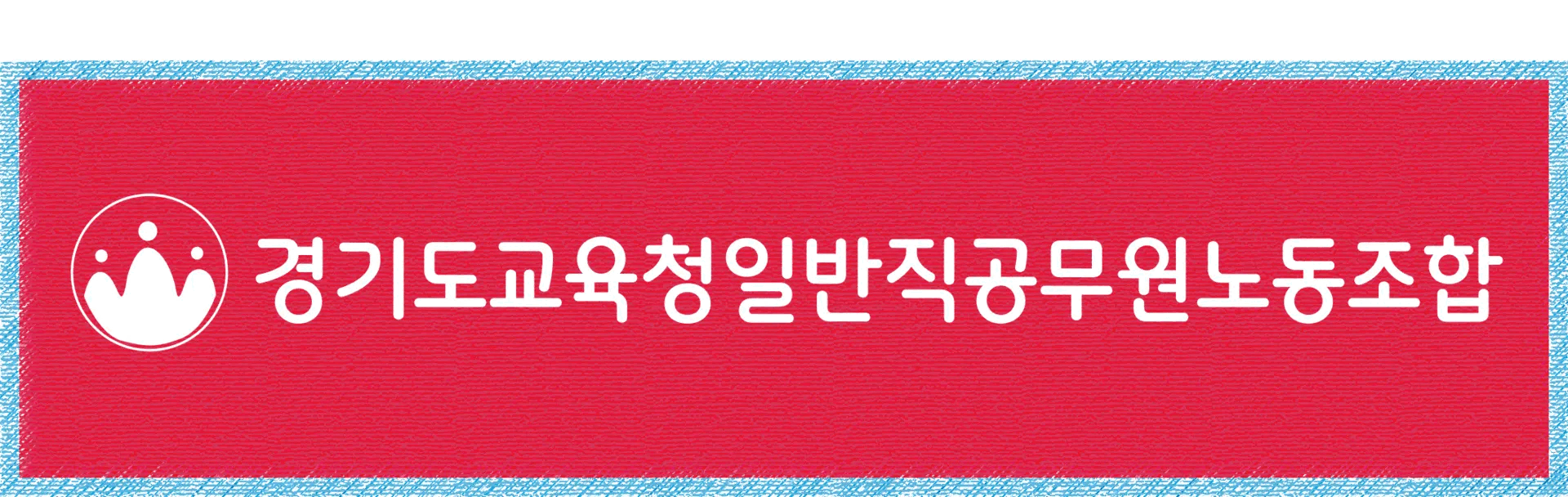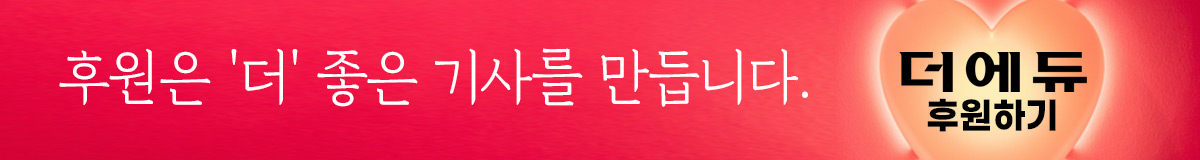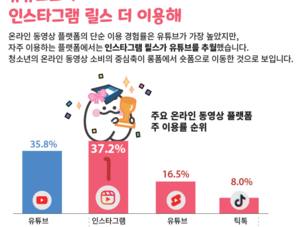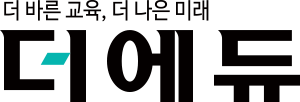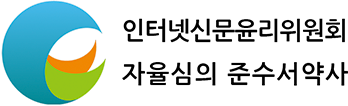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지만, 전례 없는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연수 이수가 강사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수를 들어서 보상으로 연결이 될 만한 것이 없다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처음에는 순수한 교육적 열정으로 참여했던 교사들도 연수 과정에서 ‘강사 활동’과 그에 따르는 수입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점차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변했다고 고백했다. 한 교사는 “연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강사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외부 강의를 ‘가성비 좋은 혜택’으로 인식했고, 심지어 “기타 소득이 7천이다, 6천이다 등으로 자기 홍보를 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죄책감과 스펙 쌓기...교사들의 정체성 혼란과 개인주의 심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사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 핵심 선도교사는 정책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한 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구팀은 정책이 교사들을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체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교사들은 외부 강의 활동을 위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며,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펙 쌓기 위해서”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더구나 이들은 외부활동에 유리한 학년이나 업무를 선택하고, 심지어 기피 업무를 맡는 대가로 학교장과 조퇴를 자유롭게 쓰는 ‘거래(deal)’를 하기도 했다.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주거나, 연수강사로 맞초대를 하며 강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품앗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다.

“쟤는 돈에 미쳐 있다”...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열
일부 선도교사들의 비상식적 활동은 학교 조직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했다. 동료 교사들은 이들을 “돈을 좇는 교사”, “쟤는 돈에 미쳐 있다” 등으로 비난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반면, 선도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노력이 학교 안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한 교사는 “내가 이 학교에서 말을 하면 돈도 안 주고 들어주지도 않는데, 저 학교 가면 강사님, 강사님 하면서 돈도 주고 대접해 준다. 학교 안에서 열심히 하면 바보인 거죠”라고 학교 밖 활동 집중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해 ‘정책에 담긴 금전적 유인이 교사들의 헌신이나 열정마저도 ‘사익을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교사들을 개인화시켜 학교 공동체의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의 경고 “‘수당 좇는 교사’ 양산, 장기적으로 헌신 약화할 것”
연구팀은 교실혁명 정책의 금전적 유인이 “도덕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채” ‘이익을 얻고 싶으면 참여하라’는 강력한 신호만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금전적 유인이라는 정책수단 자체가 “‘수당을 좇아 움직이는 교사’라는 고유한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헌신을 약화해 학교 공동체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사는 “돈이 있다는 옵션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가 없이) 한 행동이 바보가 되는 거죠”라고 말하며, 한번 금전적 보상에 익숙해진 교직 문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