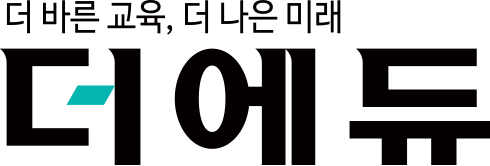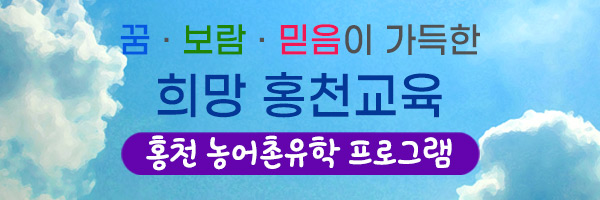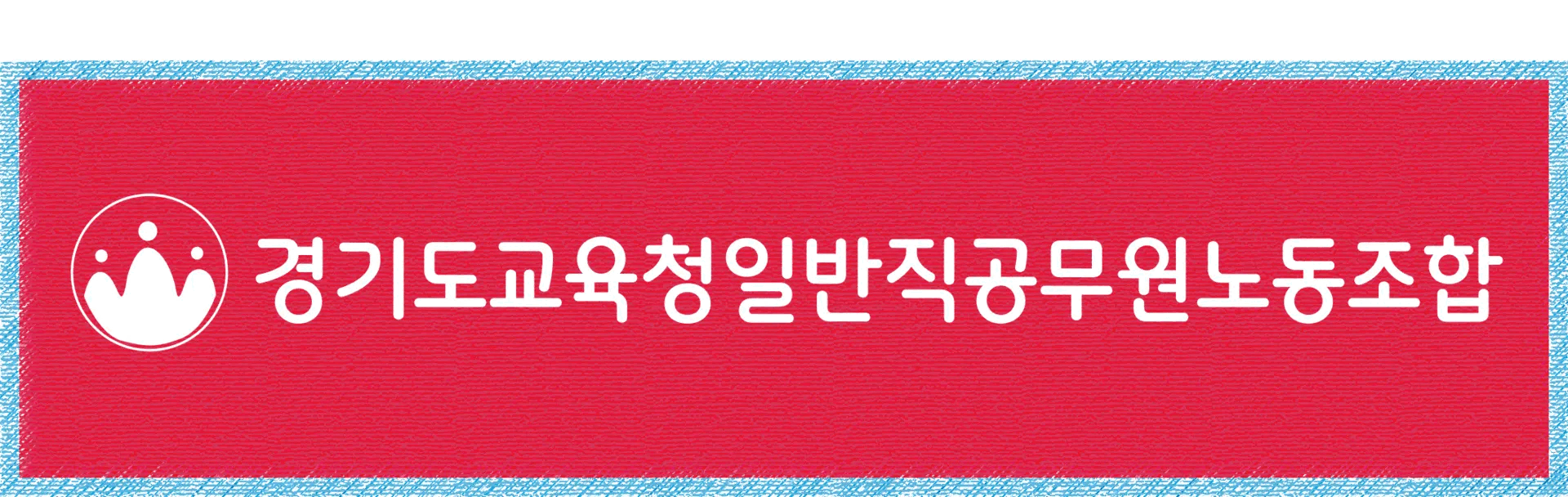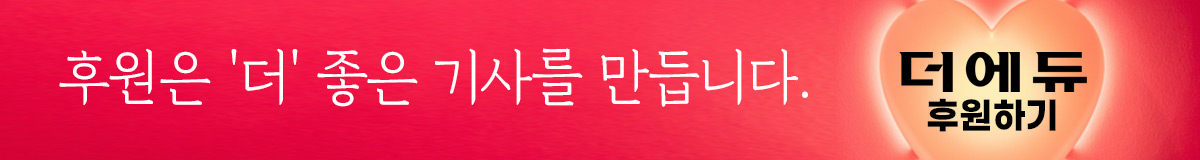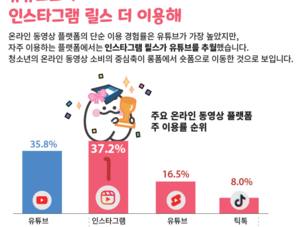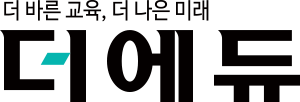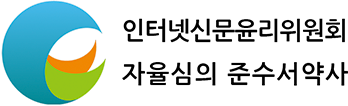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인문학적 감수성이 타 분야에 비해 다소 풍부한 필자는 소위 기계치에 가깝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도 부족하지만, 기계 앞에서는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든다.
1990년대 컴퓨터가 점차 확산되어 가던 시절, 필자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대로 저장하지 않아 거의 날려버린 적이 있었다. 통곡에 가까운 울부짖음 속에서 어리석음을 질책했지만, 당시 컴맹으로서는 의욕만 앞섰지 제대로 기본을 익히지 않고 독수리타법으로 힘들게 작성한 결과물의 상실에만 크게 연연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컴퓨터 문서 작업에 대한 관심과 배움을 통해 그리고 사라진 보고서를 상기하며 재작성한 것이 그해 지역 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전화위복’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리라.
소중한 것을 잃은 것이 자극제가 되어 연구대회에서 의외의 성과를 얻으며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바로 잃음과 얻음은 성장과의 긴밀한 함수(函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꿈, 사람, 기회, 시간과 같이 무언가를 잃는다. 그리고 상실을 삶의 실패로 단정 짓는다. 그러나 세상사에서 잃음과 얻음은 종종 깊은 함수 관계로 얽혀 있다.
무엇인가를 잃었기에 비로소 얻게 되는 삶의 역설이 있다. 이것을 알기까지 그 고통을 한 마디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이는 세상의 원리로 일반화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븐 호킹이다.
그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육체는 점점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그의 정신은 우주만큼이나 넓어졌다. “나는 병으로 인해 내 두뇌를 갈고닦는데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말했다.
결국 그는 ‘시간의 역사’(1988)를 통해 전 세계인의 사고를 바꿨고, 과학 대중화의 상징이 되었다.
호킹의 사례는 명확한 함수관계를 보여준다. 신체의 잃음 → 사유의 깊이 얻음 → 학문적 성취 얻음이 그것이다.
그가 건강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불행의 마디 마디에서 비로소 삶의 진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학에서도 이 주제는 반복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1947)는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봉쇄되며 시민들이 많은 것을 잃는 이야기다. 생명, 자유, 일상의 평온, 하지만 ‘잃음’의 끝에서 등장인물들은 공감과 책임, 공동체 의식을 얻게 된다.
특히 리외 의사는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말하며,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간다. 고통을 통해 연대의 윤리가 탄생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적으로 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잃지 말라’는 교육을 해왔다. 즉, 실수하지 말고, 점수를 깎아 먹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잃음이 있음으로써 얻음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않은가?’
이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대니얼 길버트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Stumbling on Happiness, 2006)에서 인간은 예상보다 더 큰 회복력(resilience)을 지닌다고 말한다.
실직, 이혼, 심지어 중증 장애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행복 수준을 회복하거나 더 나은 통찰을 갖게 된다는 연구를 다수 인용했다. 이는 잃음이 끝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실천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종종 ‘결핍(결여)’을 피해야 할 ‘결함(실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히려 결핍이 창의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빈 교실에서 상상력은 피어난다. 실패한 실험에서 질문은 움튼다. 좌절한 학생에게서 오히려 가장 깊은 성찰이 나온다. 이는 희귀한 일화에 그치지 않는다. 어쩌면 일반화할 정도로 자주 목격하게 된다.
교육적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일화가 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할 때의 일화이다.
그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했다.
다음 날 출근해 보니 접시 안에 잔뜩 배양돼 있어야 할 세균은 다 죽어 없었고 뚜껑이 열린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생겼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푸른곰팡이 연구를 하여 인류의 기적 같은 치료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고 노벨상을 받았다.
결국 접시 뚜껑을 닫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가 큰 성공을 거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다.
어느 교육 사례 발표에서 알려진 한 아이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졌던 한 중학생은 처음엔 매사 무기력했고 성적도 바닥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학 수업에서 ‘어린 왕자’를 읽고 나서 변화가 시작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문장을 보고 그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그는 학교 문예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현재는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다. 이는 자신의 상실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잃음’은 단절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얻음’으로 가는 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함수관계는 때로는 시간차를 두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잃는 즉시 얻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알게 된다. 그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교육이 해야 할 큰 역할은 바로 이 함수관계를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좌절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지금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이다. 그 말 한마디가 학생의 인생에 울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잃음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성장했으며 결국 귀중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