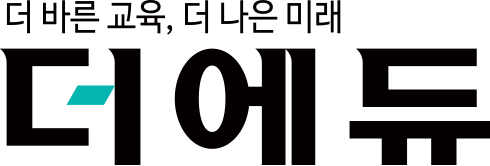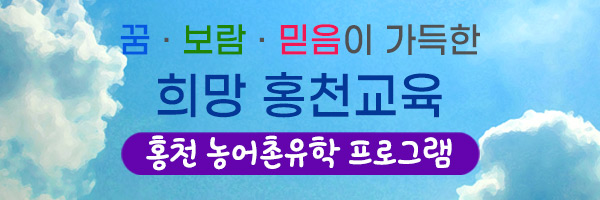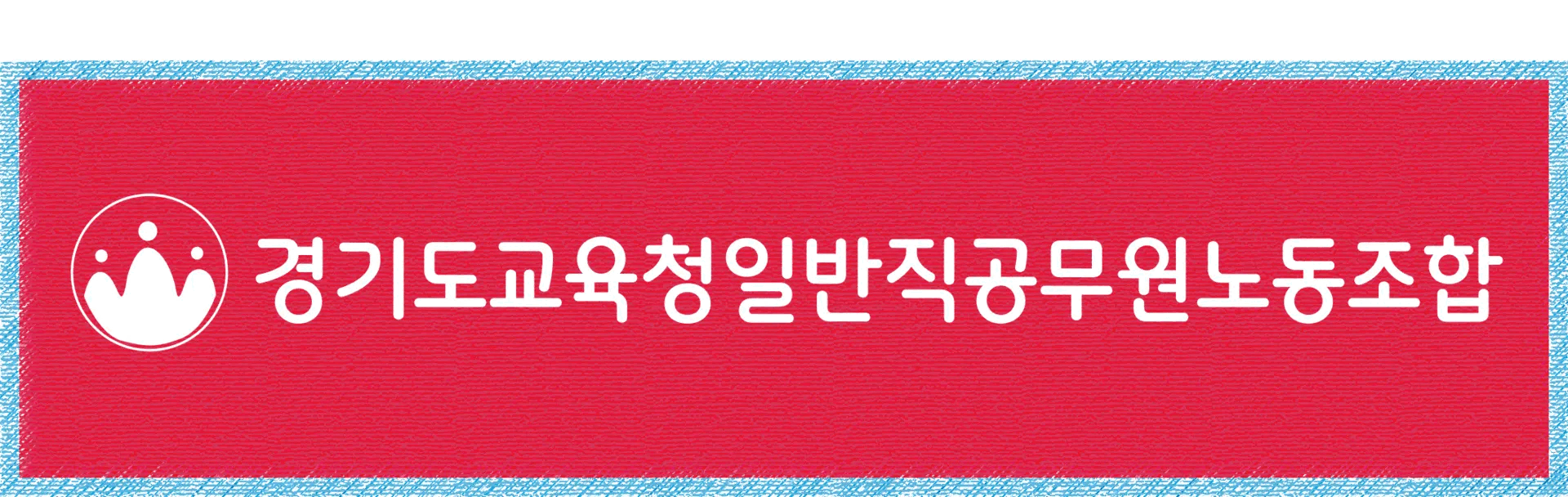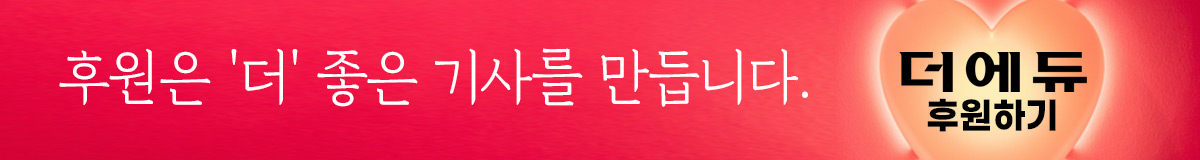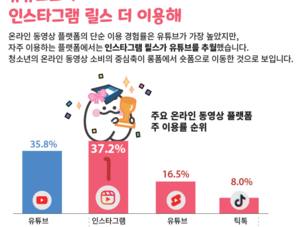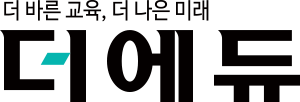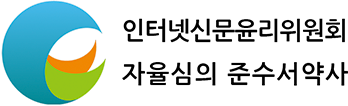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올해부터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다. 새 근무지의 학사일정을 쭉 훑어보면서 수련회, 수학여행은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옆자리 선생님께 슬쩍 물어보니 올해부터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애들이 많이 아쉬워하겠어요” 하니, 참가 비용 문제로 부담스러워하는 학부모도 있고, 지난해엔 한 학급당 최소 대여섯 명이 학교에 잔류했단다. 게다가 수학여행 도중 숙소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수련회에서 클라이밍 체험을 하다가 과호흡으로 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나저러나 수련회와 수학여행은 교사, 관리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행사임은 분명하다. 무탈하게 다녀오면 다행이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인식이 이젠 일반적인 듯하다.
# 이념 대립의 장
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다녀왔다. 금강산 관광이 활기를 띠던 시절이었다.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니 일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했고 결국 학생,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던 기억이 난다. 찬성 의견이 절반 넘어 행선지가 결정되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북한으로 여행 가는 일’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했다.
이제 여행을 인솔하는 교사가 되어보니 북한까지 못 가더라도 사소한 행선지 하나로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걸 알겠다. 여행 코스 중에 종교적 유적지가 포함되었다고, 아이와 가족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달라며 해당 코스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있었다.
늘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수학여행 자체가 정치적, 종교적 대립의 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 현장이 정치, 종교적 주제를 완벽하게 배제한 ‘살균된’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념 대립이라는 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일선 학교에서 수련회, 수학여행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니 결국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거라는 게 학교 밖의 시선이다. 가난한 학생들은 평소에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 다 같이 떠나서 추억을 쌓고 오는 행사가 사라지면 어쩌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느끼는 바는 다르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경우 경비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대개 수련회와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학교에 잔류하는 걸 택한다.
빈부격차는 학생들 간 문제만은 아니다. 학교 간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작년 봄, 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걷고 있었다. 건물 앞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눈에 띄었다. 학교에서 단체로 맞춘 야구잠바를 입은 어느 외고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이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나는 비싼 돈 내면서 뉴욕을 여행하는 중인데 저 학교 선생님들은 공짜겠지? 저런 수학여행이라면 백 번도 하겠다’였고, 두 번째는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랑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가 다였는데, 저 아이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였다.
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 악덕 고용주, 대한민국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네북이 된 거 같다는 거다. 교사에게 성직자와 같은 소명 의식, 헌신, 희생, 봉사를 요구하면서 교사를 노동자처럼 대한다는 거다.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주지 않는 악덕 고용주처럼 느껴진다는 거다.
‘희망 교실’, ‘키다리 선생님’ 사업 등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학급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했던 적이 있다. 우리 반 학생 여러 명을 데리고 자전거도 타고, 클라이밍 체험도 하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다.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얘기를 들어 보니 몇몇은 두 번 다시 하기 싫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과 볼링을 치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교육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반대해 계획이 무산되어 황당했다는 선생님, 실내 야구장에 갔는데 날아온 공을 피하지 못하고 학생 하나가 다쳐 몇 개월째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선생님이 있었다. 야구장에서 사고가 있었던 기간제 선생님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그 사건으로 관리자에게 찍힌 탓이라고 자책했다.
아이들을 위한 실천들이 내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교육 현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희생은 당연하고 책임은 다 떠안기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아이는 맡기고 싶은, 우리 사회는 참교사 죽이기에 한창이다.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일부 재가공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