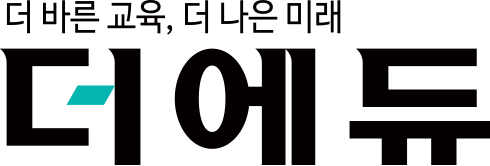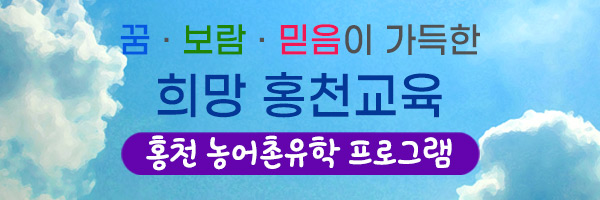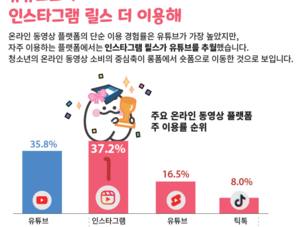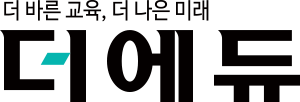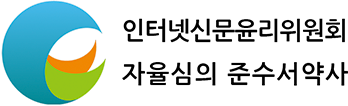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프로불편러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많은 이들이 분노와 혐오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정함이라고 말한다.
반골 기질이 있는 나는 괜히 삐딱한 마음이 들어 괴팍한 사람들이 설 자리도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다.
‘붙임성 없이 까다롭고 별난 사람들, 뭐가 그리도 불편한지 싫은 소리를 자꾸 내는 사람들, 모두가 맞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꼭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기어이 소란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비주류가 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기도 하는 위태로운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좋아한다.
그런 동료 교사가 하나 있어 학교가 쑥대밭이라도 되면 모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곤 한다.
속으로 더, 더, 더, 더 해달라고 외친다. 나는 이런 악취미를 품고 산다.
“미녀들끼리 모여계시네요.”
같은 교무실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교무실로 걸어가는 길이었다.
남학생 한 명이 우릴 보고 하는 소리다. ‘능글맞게 저런 말을 할 줄 아는 애가 있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대꾸없이 지나쳤다. 학생이 제 갈길을 떠나자, 옆에서 발맞춰 걷던 선생님이 넌지시 묻는다.
“저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순간 내 뇌는 일시 정지, 최대한 회색지대에 근접한 대답을 억지로 만들어 낸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제 딴엔 장난스럽고 센스있게 인사하고 싶었나 봐요.”
“교사를 뭘로 보는 건지 너무 징그럽잖아요. 교사가 아니더라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동료 선생님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 속에 담긴 부조리, 여성을 대상화하고 외모를 품평하는 무의식적 습관을 읽어냈다.
나는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세워서 방금 한 말이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 지적해 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를 바뀌게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딴지를 걸거나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더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를 갖추게 되면 사소한 공격도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듯 느껴져 함부로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다.
말 한마디로 위태로워지는 얄팍한 인간관계가 대부분이라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늙는다는 건 여러모로 슬픈 일인가 보다. 그런데도 아주 가끔 나를 멈춰 세우고 뒤돌아보게 하고, 바뀌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기도 알고 보면 재밌는 사람이라고,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유머가 있는 학생’이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나는 장난스럽게 ‘유머 호소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
OO 호소인 하는 유행어들을 자주 보고 들었던 탓에 자연스럽게 떠올린 농담이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자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가깝지도 편하지도 않은 그 사람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스럽다’라고 운을 떼며 말했다.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고마웠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걸 알게 됐으니까. 나를 무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또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이 참 오랜만이었다.
용감하게 괴팍하게
나는 다정한 교사이자 동료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며 산다.
아무리 내 속이 삐딱할지언정 최대한 고분고분 말하고 행동한다. 교원 평가에 적힌 학생들의 평을 빌리면 ‘항상 친절하고’, ‘학생들과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교사다.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운 나의 거짓된 다정함이 가끔 통할 때도 있다. 수업 중에 코를 골며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잠자는 사자의 콧털이라도 건들일까 애간장을 태우며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운다.
대차게 코를 골며 잠들었던 게 미안했는지 그다음 시간에 웬일로 교과서를 챙겨와 수업을 듣는 노력이라도 하면 괜히 마음이 이상하다.
난 그냥 너랑 부딪히기 싫어서 그랬던 것 뿐인데. 나의 이 ‘다정한 척’ 덕분에 교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명이 조금은 연장되었을 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서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학생들에게 잘 되라는 바른 소리를 해 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도가 지나쳐서 좋게 풀어서 지도할 수도 있는 것들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간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건지 예전엔 그래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던 호랑이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서 멸종위기다.
학교에 꼭 한 명씩 있는 ‘빌런’ 선생님을 못 본 지도 오래됐다.
학교라는 조직이 완벽할 수는 없을 텐데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평화가 싫지는 않다. 하지만 ‘다정하게 살아남기’보다 ‘용감하고 괴팍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그립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집요하게 의심하고 흔들어대고 마침내 무너뜨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이 글은 실천 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