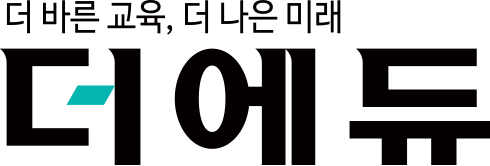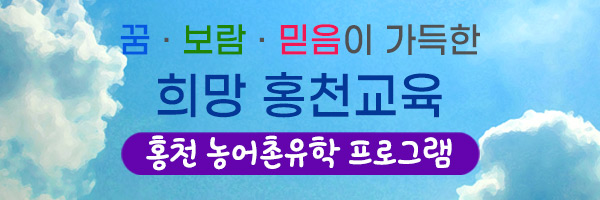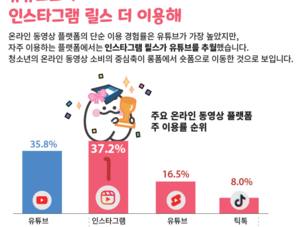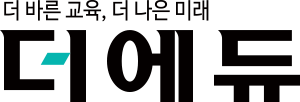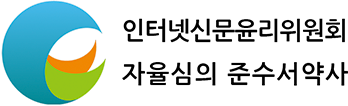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

“선생님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초임이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억울했다. 그동안 내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해 온 노력과 교실에서 함께 쌓아온 학생들과의 서사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다. 아기를 낳은 교사만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말이 특히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서 그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유아동의 성장에 대한 이해 과정이라는 것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시로서도 육아가 몸과 마음으로 겪는 유아동 존재에 대한 극적인 체험의 연속이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한편 호기심도 있었다. 사회에서 아동을 가르치는 역할을 공인해주고, 나 스스로도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교사라는 직업을 자임했기에 ‘부모됨’이라는 사건이 과연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지는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부모가 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낳아봤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낳아보니, 부모가 되면 생기는 교사의 장점이 확실히 있기는 있었다.
첫째, 발달을 ‘살아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발달이라는 것이 더 이상 연구서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게 된다. 특히 학생들을 발달의 과정 속 어딘가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내 아이도 크면 저 과정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히 떠오르게 된다.
한편 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정교해진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오늘 등교하게 되었을지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된다.
둘째, 부모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된다.
교사들을 웃기고 울리는 우비초 선생님의 블로그 에피소드 중 하나가 기억이 난다. 한 겨울에 한 학생이 반팔을 입고 등교했을 때 ‘가정에서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반팔을 입고 학교에 등교를 할까’ 하고 내심 걱정을 했던 것이 아이를 낳고 나니 ‘저렇게라도 등교해주니 감사하다’와 ‘저렇게 등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랑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정이 이러하니 학부모 상담의 태도도 더 허용적이고 온화해지는 것 같다.
셋째, 감각의 기준이 재설정된다.
예전엔 아이가 토하거나 바지에 실수라도 하면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다. 갓난아기를 키우면 매일 토를 닦고 변을 닦는 게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저귀 갈고, 토사물 닦고, 이유식 묻은 얼굴을 하루에도 수십 번 닦다 보면 똥과 토에 대한 기준이 리셋된다. 학교에서 아이가 갑자기 토하거나 바지를 버리게 되더라도, 당황스러운 마음보다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어느새 면역력과 인내력이 상승했다.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부모가 된 교사에게도 분명한 단점이 있다.
첫째, 양육자의 시선이 교육자의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교실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가령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나만의 방식이 교실에서 자꾸 나올 수 있다. 그게 잘 통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아이를 자기 방식에 끼워 맞추려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된 지식이 교사로서의 기준이 되면, 문제는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저 나이쯤 되면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은 다른 아이에겐 억울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를 깊이 알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율성을 덜 존중하게 된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학의 주류 관점은, 학생은 사고와 학습의 주체로 대해야 하고 그럴 때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자기 나름의 왜곡된 생각이라도 해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는 혼자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이동할 수 없고 심지어 많은 경우 혼자 잘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의 모든 삶은 한참 동안 보호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이를 대하다 학교에 온 교사는 자연스럽게 어른의 간섭을 필터 없이 가하게 된다.
교육적 상황을 100% 교사의 관점으로 채워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쉽사리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보장된 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훌륭한 수업으로 향하는 데에 분명한 제약이 된다.
셋째, 정서적 번아웃의 이중 노출이다.
교사는 원래도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이다. 하지만 부모가 되면 그 감정노동의 ‘퇴근이 없다’는 말을 진짜 실감하게 된다.
하루 종일 교실에서 아이들 눈빛 하나하나 읽어가며 수업하고, 상담하고, 중재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겨우 하루를 버틴다. 그런데 집에 가면 거기서 또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아기는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퇴근 후에 만날 때면, 정말이지 영혼이 잠깐 나간다. ‘잠깐만 조용히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싶은데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에너지는 넘친다.
한편, 교실에서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이름 불러 주고, 기분 달래주는 데 쓴 감정 에너지가 방전되면, 집에서도 아이에게 충분히 반응해 주지 못하게 된다. 종종 ‘양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한다. 인간으로 인해 소비한 에너지는 인간에게서 거리를 두어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학생과 아이를 좋아하는 교사라도, 하루 두 세트의 감정노동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종종 학교에 내 정서적 에너지를 올인할 수 있던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다.
교사로서의 역량, 부모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실천의 깊이
정리하자면 이렇다. 부모가 되는 것이 무조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부모가 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긴 한다. 발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부모를 공감하게 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내구성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에 아는 척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피로하다.
교사로서의 역량은 결국 부모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실천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