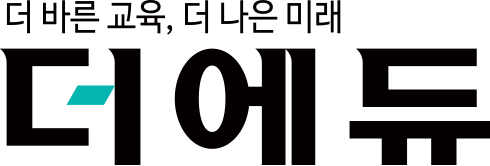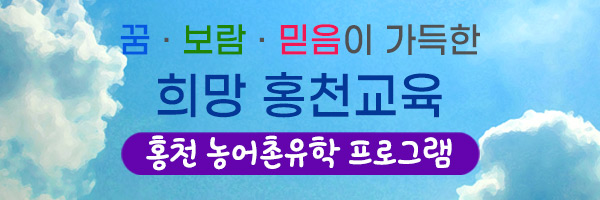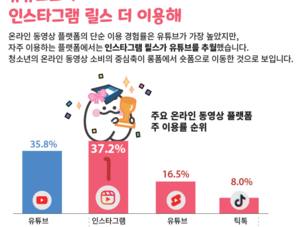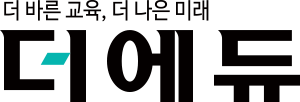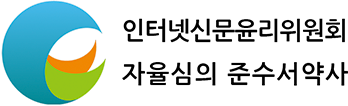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공정’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예고한 신학기 총파업은 단순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동일 공공부문 내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격차를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는 존엄의 외침이자 정당한 저항이다.
명절 휴가비 차별, 방치할 수 없는 불평등의 상징
갈등의 핵심인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약 185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대비 89%에 불과하다. 반면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이미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정률제로 전환됐다.
같은 대한민국 공공부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교육청이라는 이유만으로 30% 이상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명절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소중한 시간이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다.
교육청이 고수하고 있는 ‘정액제’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인 처우를 악화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이러한 복리후생의 격차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국가 기관의 권고마저 무시하며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학교 공동체를 지탱해 온 헌신에 대한 모독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식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조리하는 조리실무사,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행정실무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전담사 등 수많은 교육공무직의 헌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강도의 노동과 폐암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들을 ‘비정규직’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복리후생에서조차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고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생존권을 걸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에 주목해야 한다. 헌신에 대한 대가가 차별이라면, 그 어떤 노동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부른 예고된 혼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교섭은 이미 지난해 말 결렬됐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와 타협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과 형평성이라는 해묵은 핑계 뒤로 숨어버렸다.
결정적으로 지난 1월 29일 열린 시도교육감 총회는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으나, 교육당국은 끝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허비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관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다름없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부한 교육당국의 독단으로 인해, 다가오는 3월 2일 신학기 대혼란의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
차별 없는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다
교육공무직의 파업 명분은 충분하다.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내의 기형적인 차별 구조를 깨뜨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교육당국은 더이상 ‘나중에’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설 명절 전까지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확정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을 배울 수는 없다.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생의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교육청이 내려야 할 유일한 결단이자 시대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