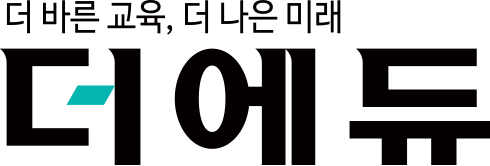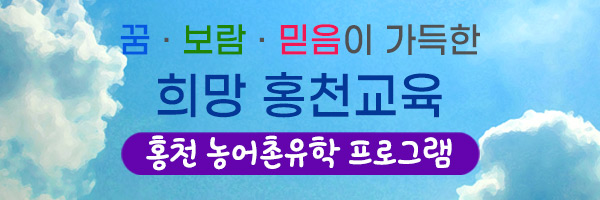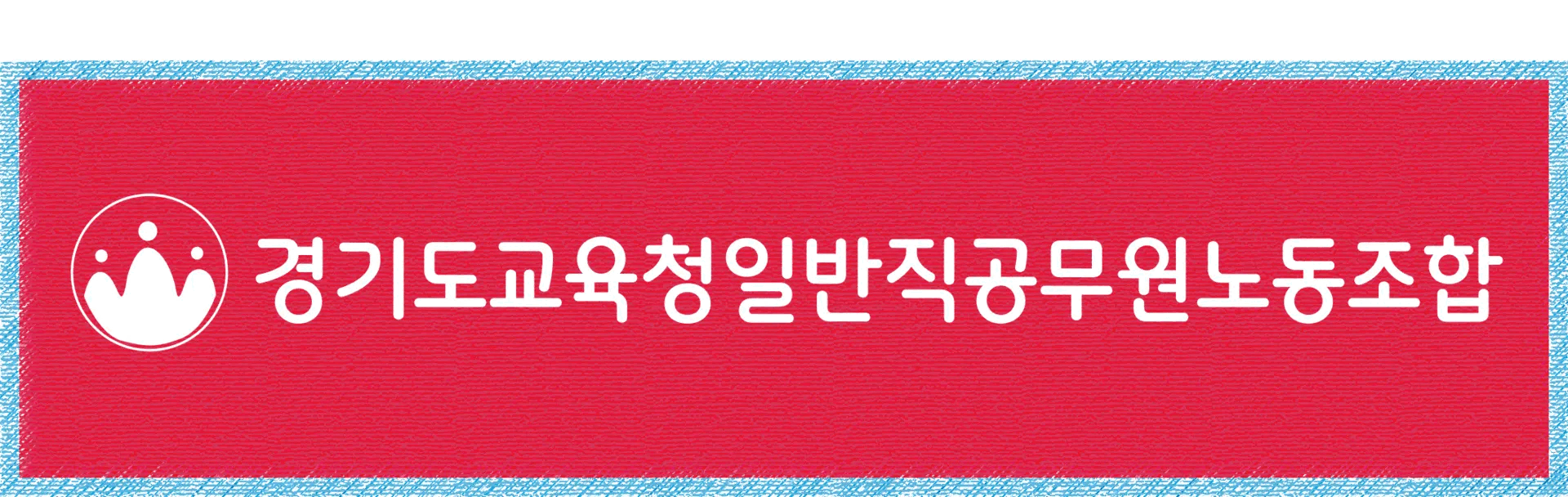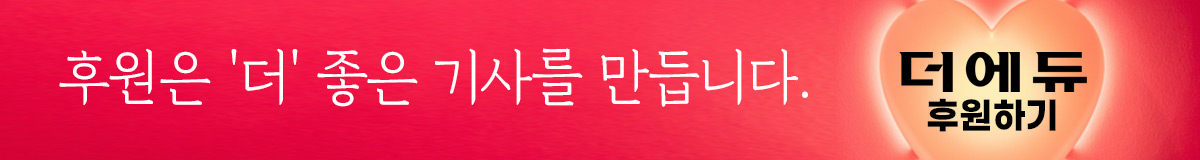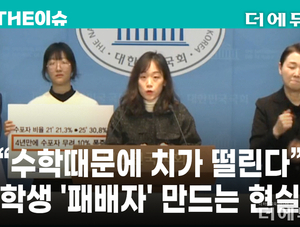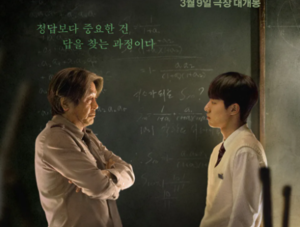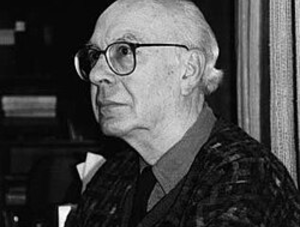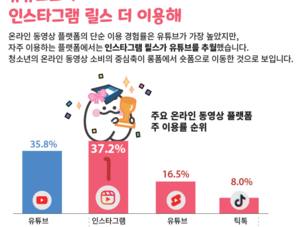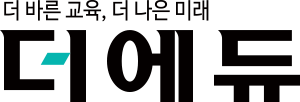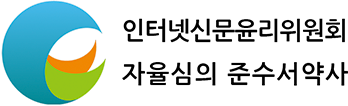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우리의 삶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가 내놓는 메시지는 자유와 사랑 자비 그리고 자기 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지혜롭게 어우러져 있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인간은 행복감을 갖는다.
시간적 비대칭(Temporal value asymmetry)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속성이 있다. 그래서 매사 좋은 쪽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 특히 꿈 많은 청소년들이 더 두드러지는 심리상태를 갖는다.
노벨상 수상작인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인 ‘카르페 디엠(Carpe diem)’에 충실함으로써 인간은 행복에 이른다고 말한다. 커다란 청새치의 물질적 가치를 기대하며 귀항하는 노인의 평범한 일상이 숭고하고 거룩한 의식으로 치환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연 행복할까?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행복도는 52.2점, 중학생은 43.1점, 고등학생은 30.3점으로 나타났다(아이들행복재단, 2024). 이뿐만 아니라 Ipsos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한국 응답자 중 48%만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는 조사한 30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결과이다.(2024)
이렇다 보니 신체와 정신의 무기력증을 느끼는 ‘소진(消盡)증후군’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그 결과 청소년 자살률 1위로 ‘회복탄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반면 “OECD 국가 학생 5명 중 4명은 학교에 있어 행복하며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시진핑은 “백리를 가면 바람이 다르고 천리를 가면 풍속이 다르다”(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고 말한다. 문화의 이질성을 시사하며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보편주의에 따른 시각차다.
우리나라의 학교문화가 서구의 여러 나라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는 ‘임계질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중론이다.
학교문화를 변혁하기 위해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전승, 문화적 전통,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르며 그 나라 국민의 정서로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사회는 히딩크 리더십의 아이콘인 부자유친(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한) 리더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신규 교사이든 교장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판·검사처럼 교육에 관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 리스크 분산을 위한 버퍼존(Buffer zone) 확보, 그리고 권한 위임과 분산의 원칙이 요구된다.
예컨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각각의 영역 자주권이 있다. 그것이 교수권이고 학습권이며 교육권이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경제학을 아홉 개의 학파로 나누며 여러 주장이 병립할 뿐 ‘합의된 경제학’은 없다고 하였다. 각 학파의 주장 중 서너 개를 칵테일처럼 섞어서 해법을 뽑아내면 된다고 한다. 공감이 가며 ‘교육에는 정도가 없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다.
헌데 우리나라 교육의 명불허전(名不虛傳)은 오바마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한쪽에서는 낡은 우산 취급하는데 다른 쪽에선 패션 상품으로 우대하는 격이다.
기존의 정책 중 회초리를 들 과오에 쇠몽둥이로 후려치는 식의 과잉 반응은 자제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교육적이다. 모든 교육 정책은 학생 행복권이라는 우산 아래 추진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구이다. 장교수 말대로 ‘합의된 경제학’이 없듯 어떠한 교육정책도 특정한 정책이 만능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수권, 학습권, 교육권의 환경이 학교마다 상이하고 다양한 스팩트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전형 방법은 대별하여 수시 모집(*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실적 전형, 특별 전형), 정시 모집(*수능 위주 전형, 실기/실적 전형)으로 구별된다. 다만, 예체능 계열의 경우 이러한 전형 방법 수 제한에서 제외되며,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나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 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전제한다.
물론 국민의 오도(誤導)된 교육열과 학력 인플레 현상은 교육계 최대의 숙제다. 공리공담(空理空談) 학교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꿈과 낭만을 즐기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다.
그 많은 다양성을 담을 학교문화가 조성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행복감이 극대화 되고 행복한 학교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