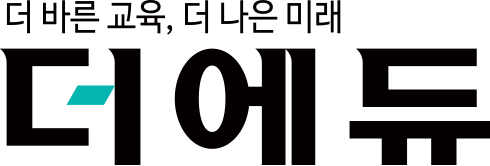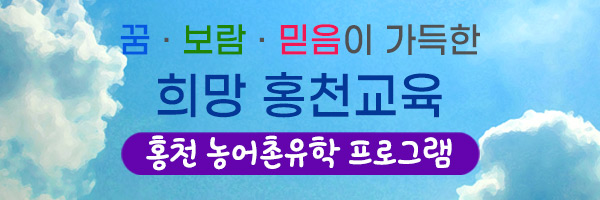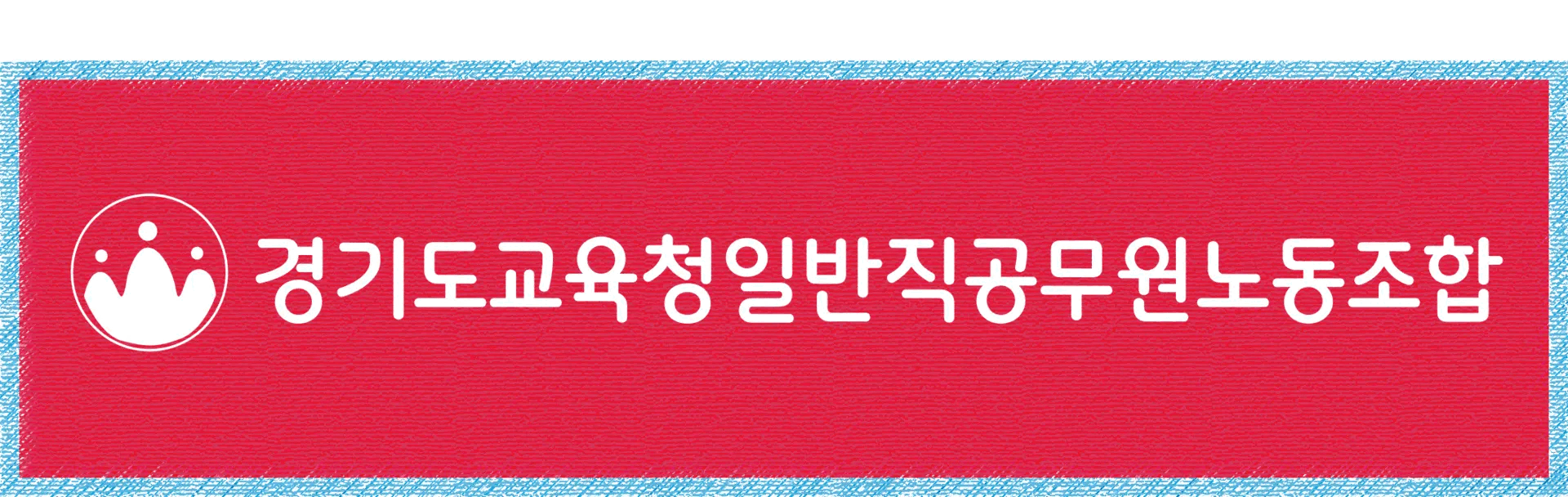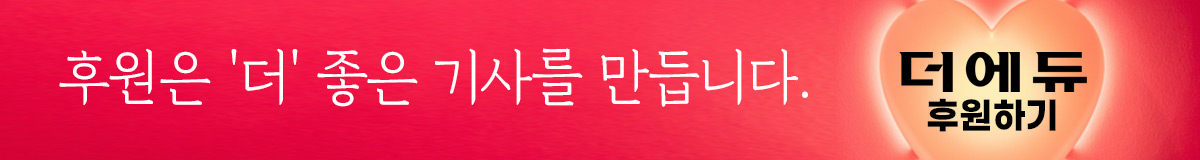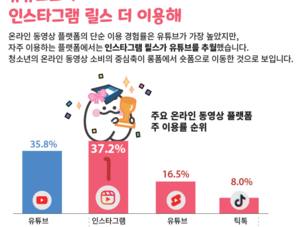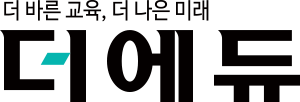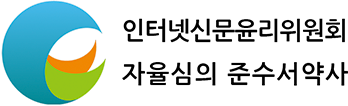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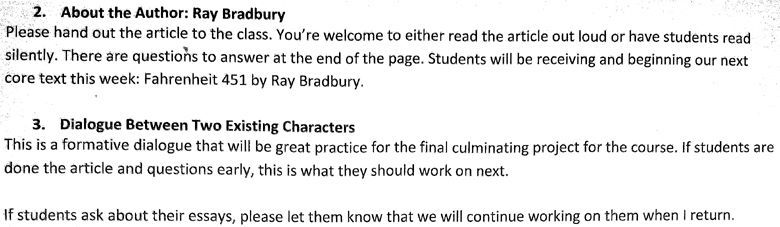
“선생님, 제 대사 좀 봐주시겠어요?”
“어디? 다시 문제를 읽어봐. 그냥 아무 대사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둘이 만난 이유와 앞으로 이어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야지.”
“세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아무 캐릭터든 괜찮아.”
“근데 아는 캐릭터가 없어요.”
“어릴 때 디즈니 영화는 봤지? 그런 것도 괜찮아.”
“어, 쌤, 얘가 제 연필 가져갔어요.”
“연필 돌려주고 너는 돌아 앉아서 앞 보고 니 꺼 해.”
“그치만 우린 짝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번 봐봐, 그래서 뭘 같이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영어 수업 중 서로 다른 작품에 나온 두 캐릭터의 대화를 쓰라는 창의적 글쓰기 활동 중의 모습이다. 이 아이에서 저 아이로 끊임 없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행동에 주의를 주고, 때로는 개별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해야 했다.
교사에게 수업 시간은 걸어다니는 시간
그런데 사실 이건 이 수업의 모습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어느 수업을 해도 교사가 앞에서 강의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은 없다. 강의로 내용 전달하는 시간은 짧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학습 활동이 꼭 핸즈온 활동이거나 적극적인 모둠 활동은 아니다. 떄로는 그냥 학습지를 푸는 활동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지도를 하거나 짧게 짧게 소그룹으로 지도를 하거나 하는 모습이 여기서는 일상이다.
예를 들어, 허진희 선생님의 수학 수업 기본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처음에 개념을 새로 가르칠 때 조금 스토리를 갖고 실생활에서 시작하는 점만 빼면 수학 개념과 공식을 알려주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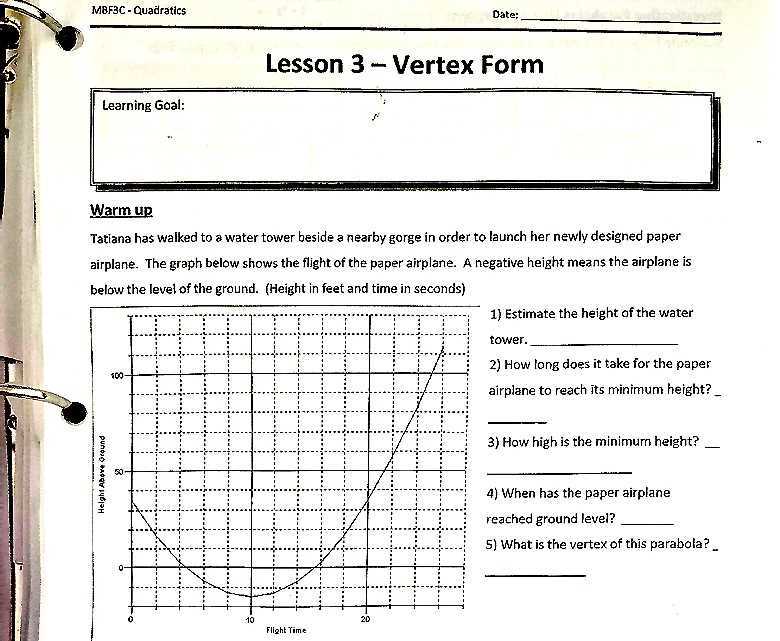
학습지나 강의 방식에서도 특별히 개별화를 위한 조정 같은 건 많지 않다. 다양한 선택권을 주거나 색다른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수학도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사용하지만 고등학교가 되면 그럴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개별화라는 건 결국 교사가 각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지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 두고, 잘 못 하는 아이들은 도와주고, 같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보이면 모아서 지도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 내내 교실을 돌 수밖에 없다.
학생 활동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필수인 교육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옆에 가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 지적하면 수업에 방해가 너무 많이 되고, 그냥 넘어가면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 또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보결이 아닌 정규 교사의 경우 이런 목적으로 돌아다닐 필요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는 차이지 별로 덜 돌아다니는 건 아니다.
같이 부전공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의 수업 계획을 보면 수업시간 내내 교실을 돌아다니며 피드백을 하는 일이 기본이긴 한 것 같고, 실습 때 본 선생님들의 모습도 대개 그렇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는 사회구성주의가 온타리오주 교육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고 그 결과 강의로 전달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갈 때 지속적인 개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런 수업이 익숙하다 보니 교사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보결이라 별 관심이 없다고 여겨 더 쉽게 딴짓을 하기도 한다. 안 그래도 보결 교사가 오면 수업을 어떻게든 안 할 생각이 가득한 중학생들의 경우는 더하다. 그래서라도 교실을 수업 내내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따로 산책이 필요 없는 일상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만 보를 걷게 된다. 이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점심 시간에 산책이라도 해서 5천보를 채우고는 했는데, 교실 안에만 있었는데도 퇴근 전에 1만보를 채우는 날도 많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에 가지 않고 같은 교실에서 다음 수업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도 그렇다.
그래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덜 걷게 되기는 한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줄어들고, 문제행동 때문에 옆에 가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도 줄어드니까.

군포초에서 담임으로 근무할 때는 따로 재보지를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다. 옥토중에 가면 말한 대로 근무가 끝나기 전에 1만보를 채우지만, 상지고를 가면 7천보만 걷거나 심지어 수업에 따라서 5천보만 걷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학년 선택과목의 경우 관심이 있어서 과목을 선택한 학생 비율도 높고 고학년이라 문제행동도 스스로 덜하니까 돌아다닐 일이 적다.
그렇게 5천보만 학교에서 걸어도 캐나다는 땅도 넓고 사람들도 걷는 거든 뭐든 몸 쓰는 걸 힘든 수고로 생각하지 않아서 모든 환경이 ‘편리하고 가깝게’ 돼 있지 않아서 결국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만 보를 채우게 되기는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건강했었는데, 여기서는 집에 있는 날이 많은 기간보다 학교에 나가는 날이 많은 기간에 확실히 운동도 더 되고 건강한 생활이 되는 것 같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