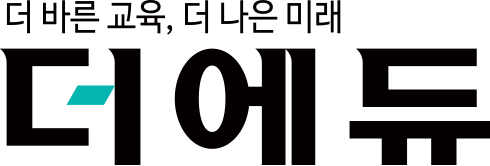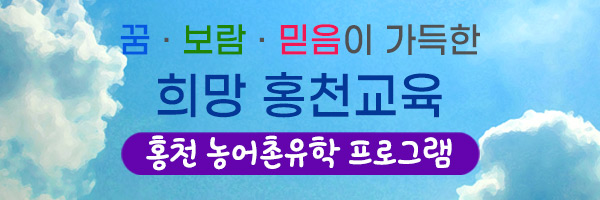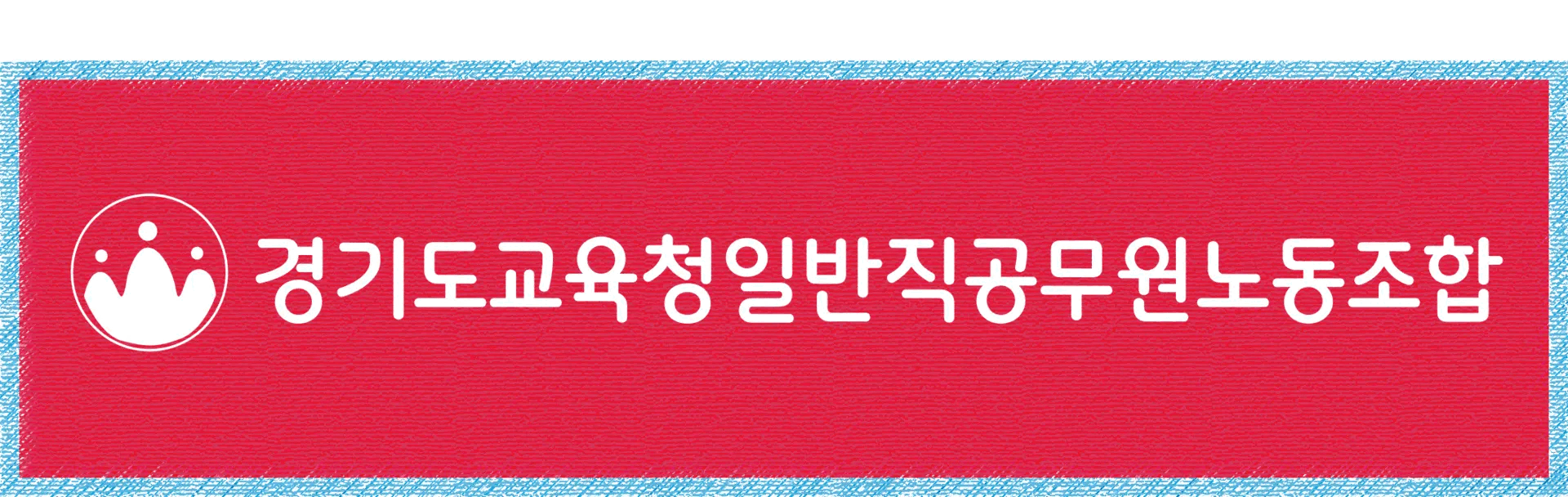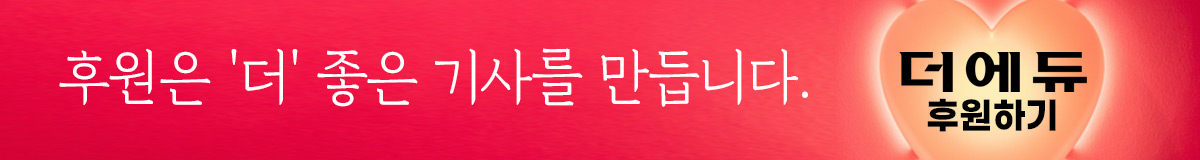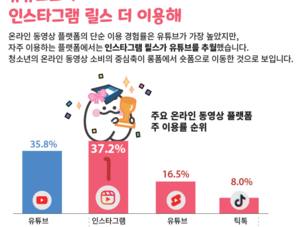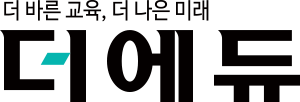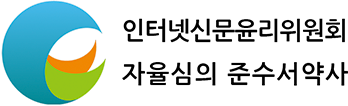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A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로지만, 그의 엄마는 그를 대단한 수재로 높이 평가한다. 이런 현상을 ‘어글리 베이비 증후군(Ugly Baby Syndrome)’이라고 한다. 그는 재력이 풍부해 유치원 시절부터 선행학습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가 착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두뇌 발달에 좋다는 유아용품부터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서민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돈의 씀씀이가 가히 광(狂)적이다.
선행학습 교사들은 상업적으로 부추겼고, 두뇌발달 교재가 1000만원을 넘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상술이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판타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3학년까지의 실력은 엄마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하지만 4학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부모의 도움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자녀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다 보니 수업태도 또한 좋지 않다. 이때 교사는 학생의 학습 태도에 질책을 가한다. 학생은 학습에 흥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 보니 담임 교사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학부모는 3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공부를 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4학년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 성적이 떨어지고 학습에 흥미를 잃었다고 자가 진단한다.
이때 A엄마는 B엄마의 마법의 탄환 이론(매스 미디어가 수용자인 대중에게 즉각적이고 획일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무릎을 친다. 일명 피하주사 이론이라고도 한다. 대중사회이론으로 속칭 족집게 과외 같은 개념이다.
A엄마는 아이의 떨어진 성적을 생각하면서 고성능 안테나를 작동시킨다. 과외비는 얼마가 들던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성적만 오르면 된다. 이럴 때 고액과외 선생님의 솔깃한 말이 들려온다.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다. 부(富)의 레벨이 비슷하고 학생들 성적 또한 고만고만한 학부모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얻은 정보다.
일 년만 과외를 하면 족집게처럼 수능에 나올 문제를 콕 집어서 가르치면 SKY 대학은 무난하다고 현혹한다. A엄마에게는 가브리엘(기쁜 소식만 가지고 온다는 성서 속 천사) 같은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설혹 명강사일지라도 족집게 강사일 수는 없다. 나이브한 A엄마는 자녀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본인도 실망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성화에 만족스럽지 못한 학창 시절(청소년)을 보낸 경우다.
A엄마의 보바리즘(bovarysme,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다르게 상상하는 기능)은 우리나라 학부모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 시대다. 미스매치는 말할 나위 없다.
13세 소년 목동 조셉은 양을 치다가 양들이 장미덩굴 울타리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 가시철망을 발명하였다.
그 무렵 중학교를 중퇴하고 전파상의 라디오 수리공으로 일하던 16세 소년 필립은 ━ 자 나사못이 문드러져 고생하다가 ╋ 자 나사못을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은 독일 김나지움학교를 중퇴하고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에 다닌 게 전부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케이츠는 하버드대학 법대를 중퇴하였다.
벤자민 플랭클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10살에 학업을 그만 두고 12살 때부터 인쇄공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피뢰침을 발명하여 영국 로열 society 회원으로 추대되고 코플리상을 수상하였다. 미국 100달러 표지 모델이며 독학으로 3개 국어를 구사하고 한때 프랑스 대사도 역임하였다.
자녀들의 역량을 과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대 평가해서도 안 된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은 학력(學歷)보다 창의성이라는 학력(學力)이 더 중요하게 인정되는 합리적 사회가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6891개에 달한다(2022, 한국직업사전). 이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고작 4년이라는 사실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