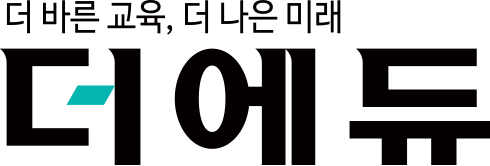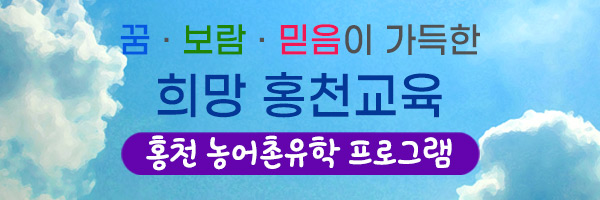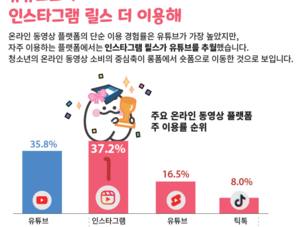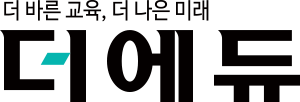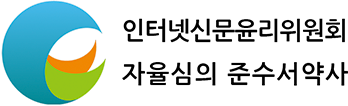더에듀 |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나온 교육부 실태조사는 씁쓸하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전국에서 4,234건 열렸다. 그중 93%는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됐다. 교사가 수업 중 욕설을 듣고, 생활지도를 하다 모욕당하고, 심지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교사가 교사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교실, 우리가 만든 현실이다.
특히 중학교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초등학생은 교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배우고, 고등학생은 이미 감정적 거리감을 고착시킨다. 그리고 교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해받을까 봐’ 말조차 아끼게 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가 화두가 되었지만, 교실의 변화는 느리다. 처벌 규정이 늘고, 절차는 복잡해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흔들린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듯’,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는 한, 제도는 무기력하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감정노동의 최전선이다. 교사 한 사람이 수업 외에도 민원 대응, 행정 보고, 심리 소진까지 감당해야 한다. 학부모의 일방적 요구가 ‘권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 역시 교실을 피폐하게 만든다. 민원은 많지만, 교사를 위한 보호 장치는 늦게 움직인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무너지는 장면이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른을 보고 배운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를 지켜본 아이들이 과연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까. 교육의 시작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다. 지금 우리는 그 신뢰를 조직적으로 허물고 있다.
교권은 단지 교사를 위한 방패가 아니다. 그건 ‘교육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규율과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교실에서 무슨 창의력이고, 인성이고, 미래 교육인가. 교사가 설 수 없는 학교에선 누구도 성장할 수 없다.
이제는 학교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라는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학생을 보호하는 만큼,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교권 회복은 처벌보다 신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우리 사회가 다시 교실을 존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스승의 날을 마주하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